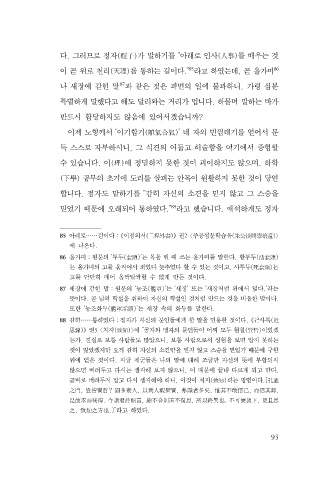Page 93 - 답문류편
P. 93
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우는 것
이 곧 위로 천리(天理)를 통하는 길이다.” 라고 하였는데, 곧 올가미
나 새장에 갇힌 말 과 같은 것은 피면의 일에 불과하니, 가령 십분
특별하게 말했다고 해도 달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물며 말하는 바가
반드시 합당하지도 않음에 있어서겠습니까?
이제 노형께서 ‘이기합기(離氣合氣)’ 네 자의 빈껍데기를 얻어서 문
득 스스로 자부하시니, 그 식견의 어둡고 허술함을 여기에서 증험할
수 있습니다. 이(理)에 정밀하지 못한 것이 괴이하지도 않으며, 하학
(下學) 공부의 초기에 도리를 살피는 안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당연
합니다. 정자도 말하기를 “감히 자신의 소견을 믿지 않고 그 스승을
믿었기 때문에 오래되어 통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정자
아래로……길이다:《이정외서(二程外書)》 권2 〈주공섬문학습유(朱公掞問學拾遺)〉
에 나온다.
올가미:원문의 ‘투두(套頭)’는 목을 맬 때 쓰는 올가미를 말한다. 활투두(活套頭)
는 올가미의 고를 움직여서 죄었다 늦추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투두(死套頭)는
고를 단단히 매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새장에 갇힌 말:원문의 ‘농조(籠罩)’는 ‘새장’ 또는 ‘새장처럼 위에서 덮다.’라는
뜻이다. 곧 남의 학설을 취하여 자신의 학설인 것처럼 만드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또한 ‘농조화두(籠罩話頭)’는 새장 속의 화두를 말한다.
감히……통하였다:정자가 자신의 문인들에게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근사록(近
思錄)》 권3 〈치지(致知)〉에 “공자와 맹자의 문인들이 어찌 모두 현철(賢哲)이었겠
는가. 진실로 보통 사람들도 많았으니, 보통 사람으로서 성현을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겠지만 오직 감히 자신의 소견만을 믿지 않고 스승을 믿었기 때문에 구한
뒤에 얻은 것이다. 지금 제군들은 나의 말에 대해 조금만 자신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버려두고 다시는 생각해 보지 않으니, 이 때문에 끝내 다르게 되고 만다.
곧바로 버려두지 말고 다시 생각해야 하니, 이것이 치지(致知)하는 방법이다.[孔孟
之門, 豈皆賢哲? 固多衆人, 以衆人觀聖賢, 弗識者多矣. 惟其不敢信己, 而信其師,
是故求而後得. 今諸君於頤言, 纔不合則置不復思, 所以終異也. 不可便放下, 更且思
之, 致知之方也.]”라고 하였다.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