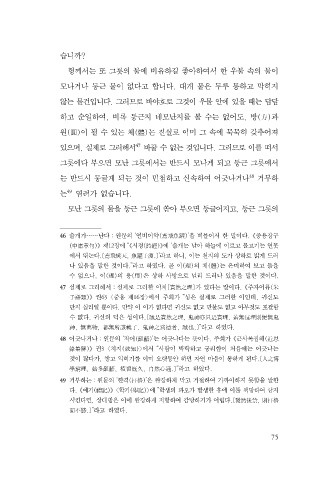Page 75 - 답문류편
P. 75
습니까?
형께서는 또 그릇의 물에 비유하길 좋아하여서 한 우물 속의 물이
모나거나 둥근 물이 없다고 합니다. 대개 물은 두루 통하고 막히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그것이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담담
하고 순일하여, 비록 둥근지 네모난지를 볼 수는 없어도, 방(方)과
원(圓)이 될 수 있는 체(體)는 진실로 이미 그 속에 묵묵히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그러해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떠서
그릇에다 부으면 모난 그릇에서는 반드시 모나게 되고 둥근 그릇에서
는 반드시 둥글게 되는 것이 민첩하고 신속하여 어긋나거나 거부하
는 염려가 없습니다.
모난 그릇의 물을 둥근 그릇에 쏟아 부으면 둥글어지고, 둥근 그릇의
솔개가……난다:원문의 ‘연비어약(鳶飛魚躍)’을 비틀어서 한 말이다. 《중용장구
(中庸章句)》 제12장에 “《시경(詩經)》에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
에서 뛰논다.[鳶飛戾天, 魚躍于淵.]’라고 하니, 이는 천지의 도가 상하로 밝게 드러
나 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곧 이(理)의 체(體)는 은미하여 보고 들을
수 없으나, 이(理)의 용(用)은 상하 사방으로 널리 드러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실제로 그러해서:실제로 그러한 이치[實然之理]가 있다는 말이다. 《주자어류(朱
子語類)》 권63 〈중용 제16장〉에서 주희가 “성은 실제로 그러한 이인데, 귀신도
단지 실리일 뿐이다. 만약 이 이가 없다면 귀신도 없고 만물도 없고 아무것도 포괄할
수 없다. 귀신의 덕은 성이다.[誠是實然之理, 鬼神亦只是實理. 若無這理則便無鬼
神, 無萬物, 都無所該載了. 鬼神之爲德者, 誠也.]”라고 하였다.
어긋나거나:원문의 ‘저어(齟齬)’는 어긋나다는 뜻이다. 주희가 《근사록집해(近思
錄集解)》 권3 〈치지(致知)〉에서 “사람이 박학하고 궁리함이 처음에는 어긋나는
것이 많다가, 쌓고 익히기를 이미 오랫동안 하면 자연 마음이 통하게 된다.[人之博
學窮理, 始多齟齬, 積習旣久, 自然心通.]”라고 하였다.
거부하는:원문의 ‘한격(扞格)’은 완강하게 막고 거절하여 가까이하지 못함을 말한
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학생의 과오가 발생한 후에 이를 책망하여 금지
시킨다면, 상대방은 이에 완강하게 저항하여 감당하기가 어렵다.[發然後禁, 則扞格
而不勝.]”라고 하였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