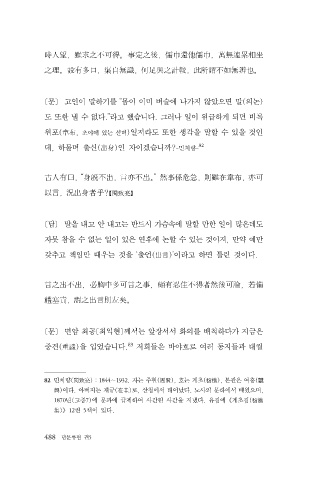Page 488 - 답문류편
P. 488
時人望, 雖求之不可得。 事定之後, 儒巾還他儒巾, 萬無連累相坐
之理。 設有多口, 渠自無識, 何足與之計較, 此所謂不如無辨也。
[문] 고인이 말하기를 “몸이 이미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면 말(의논)
도 또한 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위급하게 되면 비록
위포(韋布, 초야에 있는 선비)일지라도 또한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인
데, 하물며 출신(出身)인 자이겠습니까?-민치량-
古人有曰, “身旣不出, 言亦不出。” 然事係危急, 則雖在韋布, 亦可
以言, 況出身者乎?【閔致亮】
[답] 말을 내고 안 내고는 반드시 가슴속에 말할 만한 일이 많은데도
자못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은 연후에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예만
갖추고 책임만 때우는 것을 ‘출언(出言)’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言之出不出, 必胷中多可言之事, 頗有忍住不得者然後可論, 若備
禮塞責, 謂之出言則左矣。
[문] 면암 최공[최익현]께서는 앞장서서 화의를 배척하다가 지금은
중견(重譴)을 입었습니다. 저희들은 바야흐로 여러 동지들과 대궐
민치량(閔致亮):1844~1932. 자는 주현(周賢), 호는 계초(稽樵), 본관은 여흥(驪
興)이다. 아버지는 재규(在圭)로, 산청에서 태어났다. 노사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1870년(고종7)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사간을 지냈다. 유집에 《계초집(稽樵
集)》 12권 5책이 있다.
488 답문류편 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