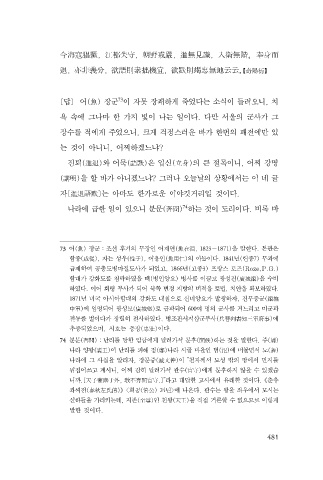Page 481 - 답문류편
P. 481
今海寇猖獗, 江都失守, 朝野戒嚴, 進無見識, 入衛無階。 奉身而
退, 亦非義分, 欲語則素拙機宜, 欲黙則竭忠無地云云。【奇陽衍】
[답] 어(魚) 장군 이 자못 장쾌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치
욕 속에 그나마 한 가지 빛이 나는 일이다. 다만 서울의 군사가 그
장수를 적에게 주었으니, 크게 걱정스러운 바가 한번의 패전에만 있
는 것이 아니니, 어찌하겠느냐?
진퇴(進退)와 어묵(語黙)은 입신(立身)의 큰 절목이니, 어찌 강명
(講明)을 할 바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 네 글
자[進退語默]는 아마도 한가로운 이야깃거리일 것이다.
나라에 급한 일이 있으니 분문(奔問) 하는 것이 도리이다. 비록 바
어(魚) 장군:조선 후기의 무장인 어재연(魚在淵, 1823~1871)을 말한다. 본관은
함종(咸從), 자는 성우(性于), 어용인(魚用仁)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7) 무과에
급제하여 공충도병마절도사가 되었고, 1866년(고종3) 프랑스 로즈(Roze,P.G.)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였을 때(병인양요) 병사를 이끌고 광성진(廣城鎭)을 수비
하였다. 이어 회령 부사가 되어 북쪽 변경 지방의 비적을 토벌, 치안을 확보하였다.
1871년 미국 아시아함대의 강화도 내침으로 신미양요가 발생하자, 진무중군(鎭撫
中軍)에 임명되어 광성보(廣城堡)로 급파되어 6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병조판서지삼군부사(兵曹判書知三軍府事)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분문(奔問):난리를 당한 임금에게 달려가서 문후(問候)하는 것을 말한다. 주(周)
나라 양왕(襄王)이 난리를 피해 정(鄭)나라 시골 마을인 범(氾)에 머물면서 노(魯)
나라에 그 사실을 알리자, 장문중(臧文仲)이 “천자께서 도성 밖의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계시니, 어찌 감히 달려가서 관수(官守)에게 문후하지 않을 수 있겠습
니까.[天子蒙塵于外, 敢不奔問官守.]”라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춘추
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4년〉에 나온다. 관수는 왕을 좌우에서 모시는
신하들을 가리키는데, 지존(至尊)인 천왕(天王)을 직접 거론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