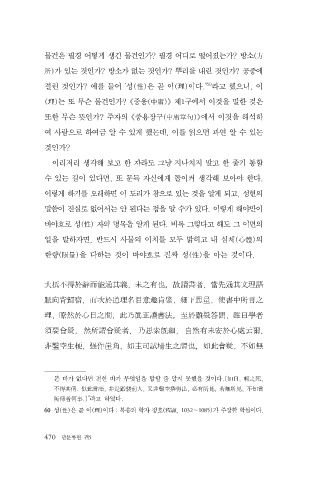Page 470 - 답문류편
P. 470
물건은 필경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필경 어디로 떨어졌는가? 방소(方
所)가 있는 것인가? 방소가 없는 것인가? 뿌리를 내린 것인가? 공중에
걸린 것인가? 예를 들어 ‘성(性)은 곧 이(理)이다.’ 라고 했으니, 이
(理)는 또 무슨 물건인가? 《중용(中庸)》 제1구에서 이것을 말한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주자의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이것을 해석하
여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읽으면 과연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한 자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줄기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문득 자신에게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를 오래하면 이 도리가 참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성현의
말씀이 진실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바야흐로 성(性) 자의 명목을 알게 된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그 이면의
일을 말하자면,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모두 밝히고 내 심체(心體)의
한량(限量)을 다하는 것이 바야흐로 진짜 성(性)을 아는 것이다.
大抵不得於辭而能通其義, 未之有也。 故讀書者, 當先通其文理語
脈向背歸宿, 而次於道理名目意趣肯綮, 細下思量, 使書中所言之
理, 瞭然於心目之間, 此乃眞正讀書法。 至於難疑答問, 雖曰學者
須要會疑, 然所謂會疑者, 乃思索旣細, 自然有未安於心處云爾,
非鑿空生梗, 強作崖角, 如主司試場生之謂也。 如此會疑, 不如無
본 바가 없다면 전한 바가 무엇임을 말할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如曰, 軻之死,
不得其傳. 似此言語, 非是蹈襲前人, 又非鑿空撰得出, 必有所見, 若無所見, 不知言
所傳者何事.]”라고 하였다.
성(性)은 곧 이(理)이다:북송의 학자 정호(程顥, 1032~1085)가 주장한 학설이다.
470 답문류편 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