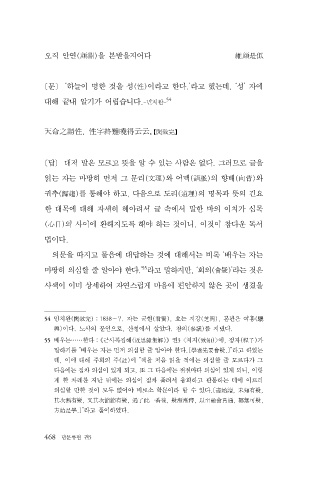Page 468 - 답문류편
P. 468
오직 안연(顏淵)을 본받을지어다 維顔是似
[문]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성’ 자에
대해 끝내 알기가 어렵습니다.-민치완-
天命之謂性, 性字終難曉得云云。【閔致完】
[답] 대저 말은 모르고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글을
읽는 자는 마땅히 먼저 그 문리(文理)와 어맥(語脈)의 향배(向背)와
귀추(歸趨)를 통해야 하고, 다음으로 도리(道理)의 명목과 뜻의 긴요
한 대목에 대해 자세히 헤아려서 글 속에서 말한 바의 이치가 심목
(心目)의 사이에 환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참다운 독서
법이다.
의문을 따지고 물음에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회의(會疑)’라는 것은
사색이 이미 상세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에 편안하지 않은 곳이 생겼을
민치완(閔致完):1838~?. 자는 군현(君賢), 호는 지강(芝岡), 본관은 여흥(驪
興)이다. 노사의 문인으로, 산청에서 살았다. 참의(參議)를 지냈다.
배우는……한다:《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3 〈치지(致知)〉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배우는 자는 먼저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學者先要會疑.]”라고 하였는
데, 이에 대해 주희의 주(註)에 “책을 처음 읽을 적에는 의심할 줄 모르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의심이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절절마다 의심이 있게 되니, 이렇
게 한 차례를 지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융회하고 관통하는 데에 이르러
의심할 만한 것이 모두 없어야 비로소 학문이라 할 수 있다.[書始讀, 未知有疑,
其次漸有疑, 又其次節節有疑, 過了此一番後, 疑漸漸釋, 以至融會貫通, 都無可疑,
方始是學.]”라고 풀이하였다.
468 답문류편 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