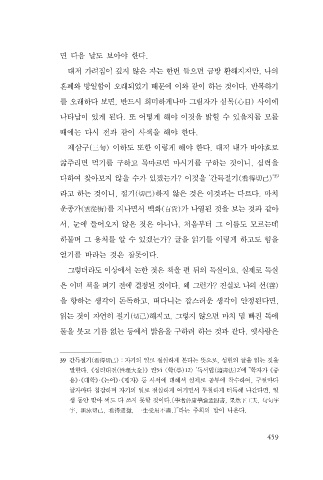Page 459 - 답문류편
P. 459
면 다음 날도 보아야 한다.
대저 가려짐이 깊지 않은 자는 한번 들으면 금방 환해지지만, 나의
혼폐와 방일함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반복하기
를 오래하다 보면, 반드시 희미하게나마 그림자가 심목(心目) 사이에
나타남이 있게 된다.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밝힐 수 있을지를 모를
때에는 다시 전과 같이 사색을 해야 한다.
제삼구(三句) 이하도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 대저 내가 바야흐로
굶주리면 먹기를 구하고 목마르면 마시기를 구하는 것이니, 심력을
다하여 찾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간득절기(看得切己)’
라고 하는 것이니, 절기(切己)하지 않은 것은 이것과는 다르다. 마치
운종가(雲從街)를 지나면서 백화(百貨)가 나열된 것을 보는 것과 같아
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나, 처음부터 그 이름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용처를 알 수 있겠는가? 글을 읽기를 이렇게 하고도 힘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더라도 이상에서 논한 것은 책을 편 뒤의 득실이요, 실제로 득실
은 이미 책을 펴기 전에 결정된 것이다. 왜 그런가? 진실로 나의 선(善)
을 향하는 생각이 돈독하고, 떠다니는 잡스러운 생각이 안정된다면,
읽는 것이 자연히 절기(切己)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기름 없는 등에서 밝음을 구하려 하는 것과 같다. 옛사람은
간득절기(看得切己):자기의 일로 절실하게 본다는 뜻으로, 성현의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 《성리대전(性理大全)》 권54 〈학(學)12〉 ‘독서법(讀書法)2’에 “학자가 《중
용》·《대학》·《논어》·《맹자》 등 사서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에 착수하여, 구절마다
글자마다 침잠하며 자기의 일로 절실하게 여기면서 투철하게 터득해 나간다면, 일
생 동안 받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學者於庸學論孟四書, 果然下工夫, 句句字
字, 涵泳切己, 看得透徹, 一生受用不盡.]”라는 주희의 말이 나온다.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