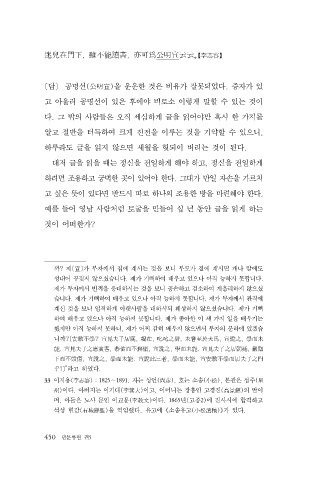Page 450 - 답문류편
P. 450
迷兒在門下, 雖不能讀書, 亦可爲公明宣云云。【李志容】
[답] 공명선(公明宣)을 운운한 것은 비유가 잘못되었다. 증자가 있
고 아울러 공명선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밖의 사람들은 오직 세심하게 글을 읽어야만 혹시 한 가지를
알고 절반을 터득하여 크게 진전을 이루는 것을 기약할 수 있으니,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세월을 헛되이 버리는 것이 된다.
대저 글을 읽을 때는 정신을 전일하게 해야 하고, 정신을 전일하게
하려면 조용하고 궁벽한 곳이 있어야 한다. 그대가 만일 자손을 가르치
고 싶은 뜻이 있다면 반드시 따로 하나의 조용한 방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남 사람처럼 토굴을 만들어 십 년 동안 글을 읽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까? 제[宣]가 부자께서 집에 계시는 것을 보니 부모가 곁에 계시면 개나 말에도
성내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뻐하여 배우고 있으나 아직 능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자께서 빈객을 응대하시는 것을 보니 공손하고 검소하여 게을리하지 않으셨
습니다. 제가 기뻐하여 배우고 있으나 아직 능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자께서 관직에
계신 것을 보니 엄격하게 아랫사람을 대하시되 훼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뻐
하여 배우고 있으나 아직 능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한 이 세 가지 일을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능하지 못하니, 제가 어찌 감히 배우지 않으면서 부자의 문하에 있겠습
니까?[安敢不學? 宣見夫子居庭, 親在, 叱咤之聲, 未嘗至於犬馬, 宣說之, 學而未
能. 宣見夫子之應賓客, 恭儉而不懈惰, 宣說之, 學而未能. 宣見夫子之居朝廷, 嚴臨
下而不毁傷, 宣說之, 學而未能. 宣說此三者, 學而未能, 宣安敢不學而居夫子之門
乎!]”라고 하였다.
이지용(李志容):1825~1891. 자는 상언(尙彦), 호는 소송(小松), 본관은 성주(星
州)이다. 아버지는 이기대(李箕大)이고, 어머니는 장흥인 고경진(高景鎭)의 딸이
며, 아들은 노사 문인 이교문(李敎文)이다. 1865년(고종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석성 현감(石城縣監)을 역임했다. 유고에 《소송유고(小松遺稿)》가 있다.
450 답문류편 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