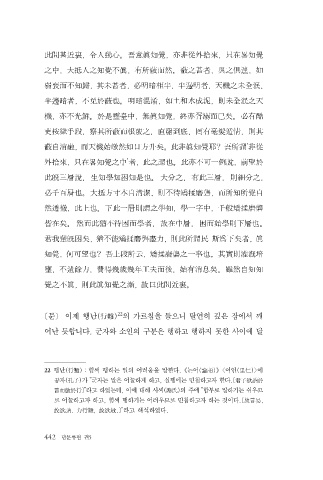Page 442 - 답문류편
P. 442
此問甚近裏, 令人動心。 吾意眞知覺, 亦非從外拾來, 只在畧知覺
之中, 大抵人之知覺不眞, 有所蔽而然。 蔽之甚者, 與之俱 , 如
弱喪而不知歸, 其未甚者, 必明暗相半, 半邊明者, 天機之未全泯,
半邊暗者, 不免於蔽也。 明暗混淆, 如土和水成泥, 則未全泯之天
機, 亦不光鮮。 於是靈臺中, 無眞知覺, 終亦胥溺而已矣。 必有酷
吏按獄手段, 察其所蔽而根覈之, 直竆到底, 罔有毫髮遁情, 則其
蔽自消融, 而天機始皦然如日方升矣。 此非眞知覺耶? 吾所謂‘非從
外拾來, 只在畧知覺之中’者, 此之謂也。 此亦不可一例說, 前聖於
此旣三層說, 生知學知困知是也。 大分之, 有此三層, 則細分之,
必千百層也。 大抵方寸本自淸潔, 則不待矯揉磨礱, 而所知所覺自
然透徹, 此上也。 下此一層則謂之學知, 學一字中, 千般矯揉磨礱
皆在矣。 然而此猶不待困而學者, 故在中層, 困而始學則下層也。
君我輩旣困矣, 猶不能矯揉磨礱盡力, 則此所謂民 斯爲下矣者, 眞
知覺, 何可望也? 吾上段所云, 矯揉磨礱之一事也。 其實則灌漑培
壅, 不遺餘力, 費得幾歲幾年工夫而後, 始有消息矣。 雖然自知知
覺之不眞, 則此眞知覺之漸, 故曰此問近裏。
[문] 이제 행난(行難) 의 가르침을 들으니 탈연히 깊은 잠에서 깨
어난 듯합니다.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행하고 행하지 못한 사이에 달
행난(行難):힘써 행하는 일의 어려움을 말한다.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공자(孔子)가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실행에는 민첩하고자 한다.[君子欲訥於
言而敏於行]”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씨(謝氏)의 주에 “함부로 말하기는 쉬우므
로 어눌하고자 하고, 힘써 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민첩하고자 하는 것이다.[放言易,
故欲訥. 力行難, 故欲敏.]”라고 해석하였다.
442 답문류편 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