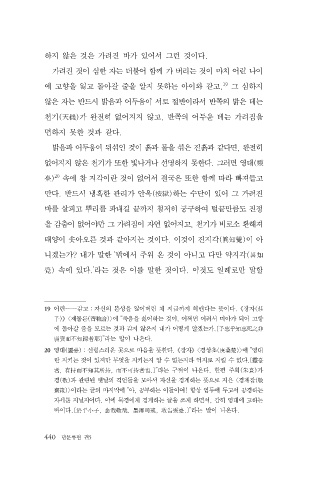Page 440 - 답문류편
P. 440
하지 않은 것은 가려진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가려진 것이 심한 자는 더불어 함께 가 버리는 것이 마치 어린 나이
에 고향을 잃고 돌아갈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고, 그 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절반이라서 반쪽의 밝은 데는
천기(天機)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반쪽의 어두운 데는 가려짐을
면하지 못한 것과 같다.
밝음과 어두움이 뒤섞인 것이 흙과 물을 섞은 진흙과 같다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천기가 또한 빛나거나 선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대(靈
臺) 속에 참 지각이란 것이 없어서 결국은 또한 함께 따라 빠져들고
만다. 반드시 냉혹한 관리가 안옥(按獄)하는 수단이 있어 그 가려진
바를 살피고 뿌리를 파내길 끝까지 철저히 궁구하여 털끝만큼도 진정
을 감춤이 없어야만 그 가려짐이 자연 없어지고, 천기가 비로소 환해져
태양이 솟아오른 것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지각(眞知覺)이 아
니겠는가? 내가 말한 ‘밖에서 주워 온 것이 아니고 다만 약지각(畧知
覺)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이것도 일례로만 말할
어린……같고: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헤맨다는 뜻이다. 《장자(莊
子)》 〈제물론(齊物論)〉에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서 미아가 되어 고향
에 돌아갈 줄을 모르는 것과 같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予惡乎知惡死之非
弱喪而不知歸者耶]”라는 말이 나온다.
영대(靈臺):신령스러운 곳으로 마음을 뜻한다. 《장자》 〈경상초(庚桑楚)〉에 “영대
란 지키는 것이 있지만 무엇을 지키는지 알 수 없는지라 억지로 지킬 수 없다.[靈臺
者, 有持而不知其所持, 而不可持者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한편 주희(朱熹)가
경(敬)과 관련된 옛날의 격언들을 모아서 자신을 경계하는 뜻으로 지은 〈경재잠(敬
齋箴)〉이라는 글의 마지막에 “아, 공부하는 이들이여! 항상 염두에 두고서 공경하는
자세를 지닐지어다. 이에 묵경에게 경계하는 글을 쓰게 하면서, 감히 영대에 고하는
바이다.[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라는 말이 나온다.
440 답문류편 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