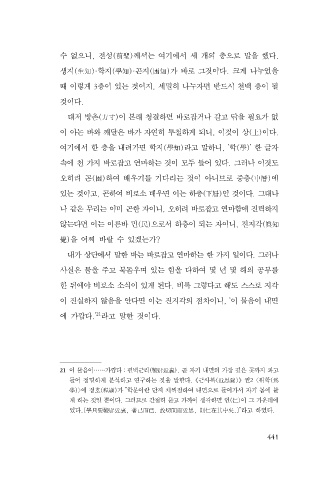Page 441 - 답문류편
P. 441
수 없으니, 전성(前聖)께서는 여기에서 세 개의 층으로 말을 했다.
생지(生知)·학지(學知)·곤지(困知)가 바로 그것이다. 크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3층이 있는 것이지, 세밀히 나누자면 반드시 천백 층이 될
것이다.
대저 방촌(方寸)이 본래 청결하면 바로잡거나 갈고 닦을 필요가 없
이 아는 바와 깨달은 바가 자연히 투철하게 되니, 이것이 상(上)이다.
여기에서 한 층을 내려가면 학지(學知)라고 말하니, ‘학(學)’ 한 글자
속에 천 가지 바로잡고 연마하는 것이 모두 들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곤(困)하여 배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므로 중층(中層)에
있는 것이고, 곤하여 비로소 배우면 이는 하층(下層)인 것이다. 그대나
나 같은 무리는 이미 곤한 자이니, 오히려 바로잡고 연마함에 진력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른바 민(民)으로서 하층이 되는 자이니, 진지각(眞知
覺)을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내가 상단에서 말한 바는 바로잡고 연마하는 한 가지 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물을 주고 북돋우며 있는 힘을 다하여 몇 년 몇 해의 공부를
한 뒤에야 비로소 소식이 있게 된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지각
이 진실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는 진지각의 점차이니, ‘이 물음이 내면
에 가깝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 물음이……가깝다:편벽근리(鞭辟近裏). 곧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爲
學)〉에 정호(程顥)가 “학문이란 단지 채찍질하여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에 붙
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에
있다.[學只要鞭辟近裏, 著己而已. 故切問而近思, 則仁在其中矣.]”라고 하였다.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