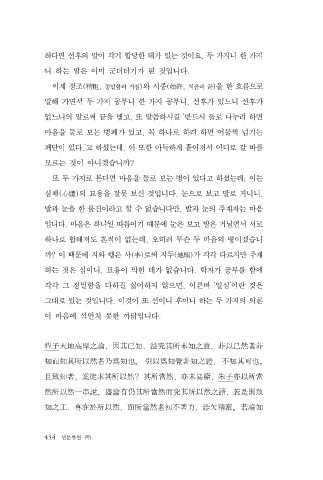Page 434 - 답문류편
P. 434
하다면 선후의 말이 각기 합당한 데가 있는 것이요, 두 가지니 한 가지
니 하는 말은 이미 군더더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조(精粗, 정밀함과 거침)와 시종(始終, 처음과 끝)을 한 흐름으로
말해 가면서 두 가지 공부니 한 가지 공부니, 선후가 있느니 선후가
없느니의 말로써 끝을 맺고, 또 말씀하시길 ‘반드시 둘로 나누려 하면
마음을 둘로 보는 병폐가 있고, 꼭 하나로 하려 하면 어물쩍 넘기는
폐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아득하게 흩어져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두 가지로 본다면 마음을 둘로 보는 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심체(心體)의 묘용을 잘못 보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거니니,
발과 눈을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발과 눈의 주재자는 마음
입니다. 마음은 하나일 따름이기 때문에 눈은 보고 발은 거닐면서 서로
하나로 합해져도 흔적이 없는데, 오히려 무슨 두 마음의 병이겠습니
까? 이 때문에 지와 행은 사(事)로써 지두(地頭)가 각각 다르지만 주재
하는 것은 심이니, 묘용이 막힌 데가 없습니다. 학자가 공부를 함에
각각 그 정밀함을 다하길 싫어하지 않으면, 이른바 ‘일심’이란 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선이니 후이니 하는 두 가지의 의론
이 마음에 석연치 못한 까닭입니다.
程子天地高厚之論, 因其已知, 益究其所未知之意, 非以已然者非
知而知其所以然者乃爲知也。 引以爲知覺非知之證, 不知其可也。
且致知者, 奚徒求其所以然? 其所當然, 亦未易竆, 朱子亦以所當
然所以然一串說。 盛論有仍其所當然而究其所以然之語, 若是則致
知之工, 專在於所以然, 而所當然者初不著力, 恐欠精密。 若論知
434 답문류편 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