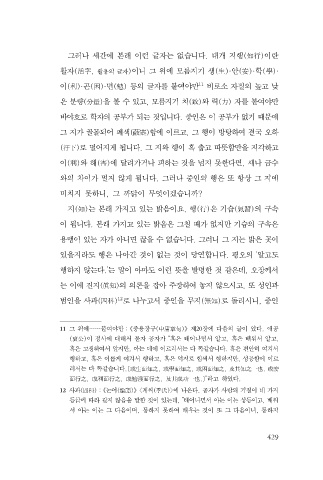Page 429 - 답문류편
P. 429
그러나 세간에 본래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대개 지행(知行)이란
활자(活字, 활용의 글자)이니 그 위에 모름지기 생(生)·안(安)·학(學)·
이(利)·곤(困)·면(勉) 등의 글자를 붙여야만 비로소 자질의 높고 낮
은 분량(分量)을 볼 수 있고, 모름지기 치(致)와 력(力) 자를 붙여야만
바야흐로 학자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중인은 이 공부가 없기 때문에
그 지가 골몰되어 폐색(蔽塞)함에 이르고, 그 행이 방탕하여 결국 오하
(汙下)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지와 행이 혹 춥고 따뜻함만을 지각하고
이(利)와 해(害)에 달려가거나 피하는 것을 넘지 못한다면, 새나 금수
와의 차이가 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중인의 행은 또 항상 그 지에
미치지 못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지(知)는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음이요, 행(行)은 기습(氣習)의 구속
이 됩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음은 그칠 때가 없지만 기습의 구속은
용맹이 있는 자가 아니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는 밝은 곳이
있을지라도 행은 나아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오의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마도 이런 뜻을 발명한 것 같은데, 오장께서
는 이에 진지(眞知)의 의론을 잡아 주장하여 놓지 않으시고, 또 성인과
범인을 사과(四科) 로 나누고서 중인을 무지(無知)로 돌리시니, 중인
그 위에……붙여야만:《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다음의 글이 있다. 애공
(哀公)이 정사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혹은 태어나면서 알고, 혹은 배워서 알고,
혹은 고생하여서 알지만, 아는 데에 이르러서는 다 똑같습니다. 혹은 편안히 여겨서
행하고, 혹은 이롭게 여겨서 행하고, 혹은 억지로 힘써서 행하지만, 성공함에 이르
러서는 다 똑같습니다.[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一也. 或安
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强而行之, 及其成功一也.]”라고 하였다.
사과(四科):《논어(論語)》 〈계씨(季氏)〉에 나온다. 공자가 사람의 기질이 네 가지
등급에 따라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아는 이는 상등이고, 배워
서 아는 이는 그 다음이며, 통하지 못하여 배우는 것이 또 그 다음이니, 통하지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