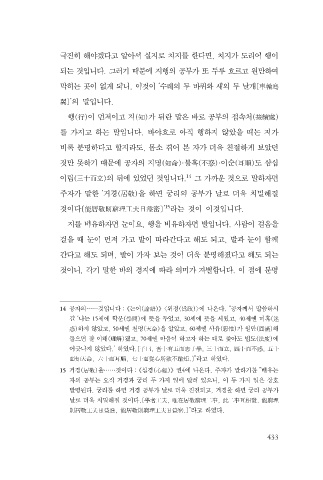Page 433 - 답문류편
P. 433
극진히 해야겠다고 알아서 실지로 치지를 한다면, 치지가 도리어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행의 공부가 또 두루 흐르고 원만하여
막히는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이 ‘수레의 두 바퀴와 새의 두 날개[車輪鳥
翼]’의 말입니다.
행(行)이 먼저이고 지(知)가 뒤란 말은 바로 공부의 접속처(接續處)
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바야흐로 아직 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가
비록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몸소 겪어 본 자가 더욱 친절하게 보았던
것만 못하기 때문에 공자의 지명(知命)·불혹(不惑)·이순(耳順)도 삼십
이립(三十而立)의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까운 것으로 말하자면
주자가 말한 ‘거경(居敬)을 하면 궁리의 공부가 날로 더욱 치밀해질
것이다[能居敬則竆理工夫日益密]’ 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를 비유하자면 눈이요, 행을 비유하자면 발입니다.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눈이 먼저 가고 발이 따라간다고 해도 되고, 발과 눈이 함께
간다고 해도 되며, 발이 가자 보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해도 되는
것이니, 각기 말한 바의 경지에 따라 의미가 자별합니다. 이 점에 분명
공자의……것입니다:《논어(論語)》 〈위정(爲政)〉에 나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
길 ‘나는 15세에 학문(學問)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뜻을 세웠고, 40세엔 미혹(迷
惑)하지 않았고, 50세엔 천명(天命)을 알았고, 60세엔 사유(思惟)가 원만(圓滿)해
들으면 잘 이해(理解)됐고, 70세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좇아도 법도(法度)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였다.[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
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고 하였다.
거경(居敬)을……것이다:《심경(心經)》 권4에 나온다. 주자가 말하기를 “배우는
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가지 일에 달려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상호
발명된다. 궁리를 하면 거경 공부가 날로 더욱 진전되고, 거경을 하면 궁리 공부가
날로 더욱 치밀해질 것이다.[學者工夫, 唯在居敬窮理二事, 此二事互相發. 能窮理
則居敬工夫日益進, 能居敬則窮理工夫日益密.]”라고 하였다.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