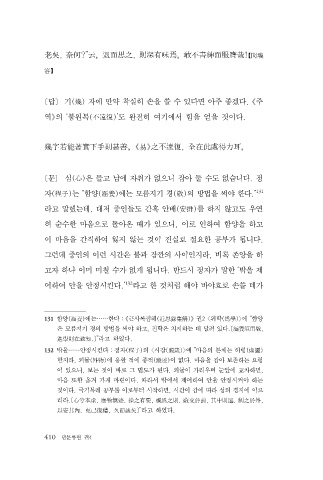Page 410 - 답문류편
P. 410
老矣, 奈何?”云。 退而思之, 則深有味焉。 敢不書紳而服膺哉!【閔璣
容】
[답] 기(幾) 자에 만약 착실히 손을 쓸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 《주
역》의 ‘불원복(不遠復)’도 완전히 여기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幾字若能著實下手則甚善。 《易》之不遠復, 全在此處得力耳。
[문] 심(心)은 들고 남에 자취가 없으니 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정
자(程子)는 “함양(涵養)에는 모름지기 경(敬)의 방법을 써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대저 중인들도 간혹 안배(安排)를 하지 않고도 우연
히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온 때가 있으니, 이로 인하여 함양을 하고
이 마음을 간직하여 잃지 않는 것이 진실로 절요한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중인의 이런 시간은 불과 잠깐의 사이인지라, 비록 존양을 하
고자 하나 이미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정자가 말한 ‘밖을 제
어하여 안을 안정시킨다.’ 라고 한 것처럼 해야 바야흐로 손쓸 데가
함양(涵養)에는……한다:《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2 〈위학(爲學)〉에 “함양
은 모름지기 경의 방법을 써야 하고, 진학은 치지하는 데 달려 있다.[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라고 하였다.
밖을……안정시킨다:정자(程子)의 〈시잠(視箴)〉에 “마음의 본체는 허령(虛靈)
한지라, 외물(外物)에 응할 적에 종적(蹤迹)이 없다. 마음을 잡아 보존하는 요령
이 있으니, 보는 것이 바로 그 법도가 된다. 외물이 가리우며 눈앞에 교차하면,
마음 또한 옮겨 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밖에서 제어하여 안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다. 극기복례 공부를 이로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감에 따라 성의 경지에 이르
리라.[心兮本虛, 應物無迹. 操之有要, 視爲之則. 蔽交於前, 其中則遷. 制之於外,
以安其內. 克己復禮, 久而誠矣]”라고 하였다.
410 답문류편 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