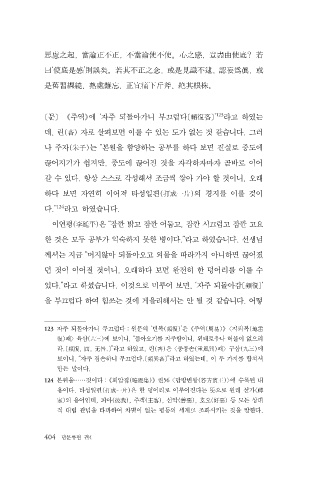Page 404 - 답문류편
P. 404
思慮之起, 當論正不正, 不當論使不使。 心之感, 豈盡由使底? 若
曰‘使底是感’則誤矣。 若其不正之念, 或是見識不逮, 認妄爲眞, 或
是舊習纏繞, 熟處難忘, 正宜痛下斤斧, 絶其根株。
[문] 《주역》에 ‘자주 되돌아가니 부끄럽다[頻復吝]’ 라고 하였는
데, 린(吝) 자로 살펴보면 이룰 수 있는 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
나 주자(朱子)는 “본원을 함양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진실로 중도에
끊어지기가 쉽지만, 중도에 끊어진 것을 자각하자마자 곧바로 이어
갈 수 있다. 항상 스스로 각성해서 조금씩 쌓아 가야 할 것이니, 오래
하다 보면 자연히 이어져 타성일편(打成一片)의 경지를 이룰 것이
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연평(李延平)은 “잠깐 밝고 잠깐 어둡고, 잠깐 시끄럽고 잠깐 고요
한 것은 모두 공부가 익숙하지 못한 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
께서는 지금 “머지않아 되돌아오고 외물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끊어졌
던 것이 이어질 것이니, 오래하다 보면 완전히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자주 되돌아감[頻復]’
을 부끄럽다 하여 힘쓰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
자주 되돌아가니 부끄럽다:원문의 ‘빈복(頻復)’은 《주역(周易)》 〈지뢰복(地雷
復)괘〉 육삼(六三)에 보이니, “돌아오기를 자주함이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으리
라.[頻復, 厲, 无咎.]”라고 하였고, 린(吝)은 〈중풍손(重風巽)괘〉 구삼(九三)에
보이니, “자주 겸손하니 부끄럽다.[頻巽吝]”라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본원을……것이다:《회암집(晦庵集)》 권56 〈답방빈왕(答方賓王)〉에 수록된 내
용이다. 타성일편(打成一片)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원래 선가(禪
家)의 용어인데, 피아(彼我), 주객(主客), 선악(善惡), 호오(好惡) 등 모든 상대
적 대립 관념을 타파하여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계로 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04 답문류편 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