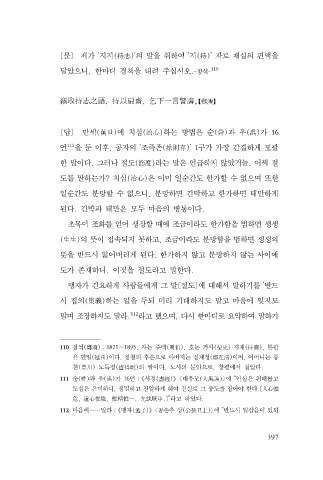Page 397 - 답문류편
P. 397
[문] 제가 ‘지지(持志)’의 말을 취하여 ‘지(持)’ 자로 재실의 편액을
달았으니, 한마디 경책을 내려 주십시오.-정석-
竊取持志之語, 持以扁齋, 乞下一言警誨。【鄭 】
[답] 만세(萬世)에 치심(治心)하는 방법은 순(舜)과 우(禹)가 16
언 을 둔 이후, 공자의 ‘조즉존(操則存)’ 1구가 가장 간결하게 포괄
한 말이다. 그러나 절도(節度)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거늘, 어찌 절
도를 말하는가? 치심(治心)은 이미 일순간도 한가할 수 없으며 또한
일순간도 분망할 수 없으니, 분망하면 긴박하고 한가하면 태만하게
된다. 긴박과 태만은 모두 마음의 병통이다.
초목이 조화를 얻어 생장할 때에 조금이라도 한가함을 범하면 생생
(生生)의 뜻이 접속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분망함을 범하면 생생의
뜻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 한가하지 않고 분망하지 않는 사이에
도가 존재하니, 이것을 절도라고 말한다.
맹자가 긴요하게 사람들에게 그 말[절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반드
시 집의(集義)하는 일을 두되 미리 기대하지도 말고 마음에 잊지도
말며 조장하지도 말라.’ 라고 했으며,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기
정석(鄭 ):1821~1895. 자는 주백(周伯), 호는 거사(蕖史)·지재(持齋), 본관
은 연일(延日)이다. 정철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정재청(鄭在淸)이며, 어머니는 풍
천(豊川) 노득정(盧得珽)의 딸이다. 노사의 문인으로, 창평에서 살았다.
순(舜)과 우(禹)가 16언:《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게 하여 진실로 그 중도를 잡아야 한다.[人心惟
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마음에……말라:《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반드시 일삼음이 있되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