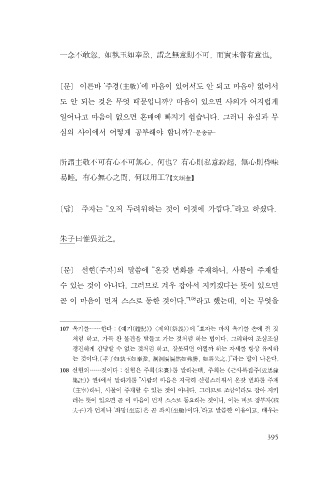Page 395 - 답문류편
P. 395
一念不敢忽, 如執玉如奉盈, 謂之無意則不可, 而實未嘗有意也。
[문] 이른바 ‘주경(主敬)’에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이 없어서
도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있으면 사의가 어지럽게
일어나고 마음이 없으면 혼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유심과 무
심의 사이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문송규-
所謂主敬不可有心不可無心, 何也? 有心則私意紛起, 無心則昏昧
易睡。 有心無心之間, 何以用工?【文頌奎】
[답] 주자는 “오직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에 가깝다.”라고 하셨다.
朱子曰惟畏近之。
[문] 선현[주자]의 말씀에 “온갖 변화를 주재하니, 사물이 주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겨우 잡아서 지키겠다는 뜻이 있으면
곧 이 마음이 먼저 스스로 동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옥기를……한다:《예기(禮記)》 〈제의(祭義)〉에 “효자는 마치 옥기를 손에 쥔 것
처럼 하고, 가득 찬 물건을 받들고 가는 것처럼 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조심조심
경건하게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하고,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자세를 항상 유지하
는 것이다.[孝子如執玉如奉盈, 洞洞屬屬然如弗勝, 如將失之.]”라는 말이 나온다.
선현의……것이다:선현은 주희(朱熹)를 말하는데, 주희는 《근사록집주(近思錄
集註)》 권4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신령스러워서 온갖 변화를 주재
(主宰)하니, 사물이 주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잡아 지키
려는 뜻이 있으면 곧 이 마음이 먼저 스스로 동요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정부자(程
夫子)가 언제나 ‘좌망(坐忘)은 곧 좌치(坐馳)이다.’라고 말씀한 이유이고, 배우는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