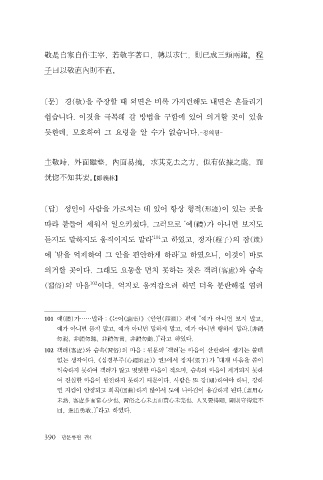Page 390 - 답문류편
P. 390
敬是自家自作主宰, 若敬字著口, 轉以求仁, 則已成三頭兩緖。 程
子曰以敬直內則不直。
[문] 경(敬)을 주장할 때 외면은 비록 가지런해도 내면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갈 방법을 구함에 있어 의거할 곳이 있을
듯한데, 모호하여 그 요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정의림-
主敬時, 外面雖整, 內面易撓。 求其克去之方, 似有依據之處, 而
恍惚不知其要。【鄭義林】
[답]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항상 형적(形迹)이 있는 곳을
따라 붙들어 세워서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 고 하였고, 정자(程子)의 잠(箴)
에 ‘밖을 억제하여 그 안을 편안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의거할 곳이다. 그래도 요동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객려(客慮)와 습속
(習俗)의 마음 이다. 억지로 움켜잡으려 하면 더욱 분란해질 염려
예(禮)가……말라:《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에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非禮
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하였다.
객려(客慮)와 습속(習俗)의 마음:원문의 ‘객려’는 마음이 산란하여 생기는 쓸데
없는 생각이다. 《심경부주(心經附註)》 권3에서 장자(張子)가 “대개 마음을 씀이
익숙하지 못하여 객려가 많고 떳떳한 마음이 적으며, 습속의 마음이 제거되지 못하
여 진실한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또 강(剛)하여야 하니, 강하
면 지킴이 안정되고 회곡(回曲)하지 않아서 도에 나아감이 용감하게 된다.[蓋用心
未熟, 客慮多而常心少也, 習俗之心未去而實心未完也. 人又要得剛, 剛則守得定不
回, 進道勇敢.]”라고 하였다.
390 답문류편 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