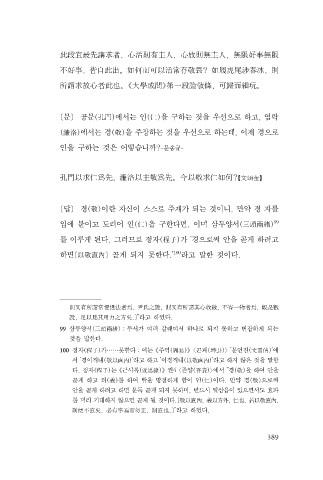Page 389 - 답문류편
P. 389
此段宜最先講求者, 心活則有主人, 心放則無主人, 無限好事無限
不好事, 皆自此出。 如何而可以活常存敬畏? 如履虎尾涉春冰, 則
所謂求放心者此也。 《大學或問》第一段論敬條, 可歸而細玩。
[문] 공문(孔門)에서는 인(仁)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염락
(濂洛)에서는 경(敬)을 주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제 경으로
인을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문송규-
孔門以求仁爲先, 濂洛以主敬爲先。 今以敬求仁如何?【文頌奎】
[답] 경(敬)이란 자신이 스스로 주재가 되는 것이니, 만약 경 자를
입에 붙이고 도리어 인(仁)을 구한다면, 이미 삼두양서(三頭兩緖)
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려고
하면[以敬直內] 곧게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則又有所謂常惺惺法者焉. 尹氏之說, 則又有所謂其心收斂, 不容一物者焉. 觀是數
說, 足以見其用力之方矣.]”라고 하였다.
삼두양서(三頭兩緖):두서가 여러 갈래여서 하나로 되지 못하고 번잡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자(程子)가……못한다:이는 《주역(周易)》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서 ‘경이직내(敬以直內)’라고 하고 ‘이경직내(以敬直內)’라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한
다. 정자(程子)는 《근사록(近思錄)》 권4 〈존양(存養)〉에서 “경(敬)을 하여 안을
곧게 하고 의(義)를 하여 밖을 방정하게 함이 인(仁)이다. 만약 경(敬)으로써
안을 곧게 하려고 하면 문득 곧게 되지 못하며, 반드시 일삼음이 있으면서도 효과
를 미리 기대하지 않으면 곧게 될 것이다.[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 若以敬直內,
則便不直矣. 必有事焉而勿正, 則直也.]”라고 하였다.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