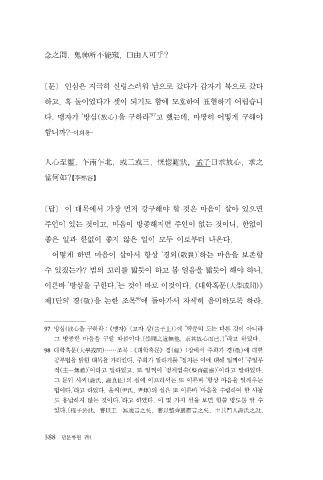Page 388 - 답문류편
P. 388
念之間, 鬼神所不能窺, 曰由人可乎?
[문] 인심은 지극히 신령스러워 남으로 갔다가 갑자기 북으로 갔다
하고, 혹 둘이었다가 셋이 되기도 함에 모호하여 표현하기 어렵습니
다. 맹자가 ‘방심(放心)을 구하라’ 고 했는데, 마땅히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이희용-
人心至靈, 乍南乍北, 或二或三, 恍惚難狀。 孟子曰求放心, 求之
當何如?【李熙容】
[답]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은 마음이 살아 있으면
주인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방종해지면 주인이 없는 것이니, 한없이
좋은 일과 한없이 좋지 않은 일이 모두 이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살아서 항상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범의 꼬리를 밟듯이 하고 봄 얼음을 밟듯이 해야 하니,
이른바 ‘방심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학혹문(大學或問)》
제1단의 경(敬)을 논한 조목 에 돌아가서 자세히 음미하도록 하라.
방심(放心을 구하라:《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방종한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라고 하였다.
대학혹문(大學或問)……조목:《대학혹문》 경(經) 1장에서 주희가 경(敬)에 대한
공부법을 밝힌 대목을 가리킨다. 주희가 말하기를 “정자는 이에 대해 일찍이 ‘주일무
적(主一無適)’이라고 말하였고, 또 일찍이 ‘정제엄숙(整齊嚴肅)’이라고 말하였다.
그 문인 사씨(謝氏, 謝良佐)의 설에 이르러서는 또 이른바 ‘항상 마음을 일깨우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윤씨(尹氏, 尹焞)의 설은 또 이른바 ‘마음을 수렴하여 한 사물
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몇 가지 설을 보면 힘쓸 방도를 알 수
있다.[程子於此, 嘗以主一無適言之矣, 嘗以整齊嚴肅言之矣. 至其門人謝氏之說,
388 답문류편 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