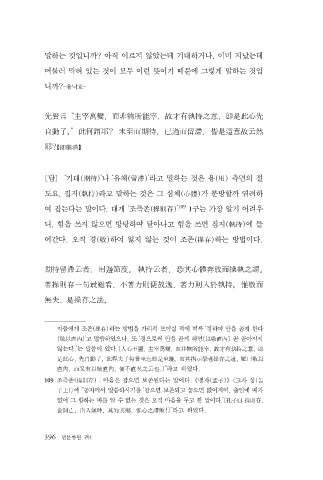Page 396 - 답문류편
P. 396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기대하거나, 이미 지났는데
머물러 막혀 있는 것이 모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
니까?-유낙호-
先賢言 “主宰萬變, 而非物所能宰, 故才有執持之意, 卽是此心先
自動了。” 此何謂耶? 未至而期待, 已過而留滯, 皆是這意故云然
耶?【柳樂浩】
[답] ‘기대(期待)’나 ‘유체(留滯)’라고 말하는 것은 용(用) 측면의 절
도요, 집지(執持)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심체(心體)가 분방할까 염려하
여 잡는다는 말이다. 대개 ‘조즉존(操則存)’ 1구는 가장 알기 어려우
니, 힘을 쓰지 않으면 방탕하여 달아나고 힘을 쓰면 집지(執持)에 들
어간다. 오직 경(敬)하여 잃지 않는 것이 조존(操存)하는 방법이다.
期待留滯云者, 用邊節度。 執持云者, 恐其心體奔放而操執之謂。
蓋操則存一句最難看, 不著力則便放逸, 著力則入於執持。 惟敬而
無失, 是操存之法。
자들에게 조존(操存)하는 방법을 가리켜 보이실 적에 비록 ‘경하여 안을 곧게 한다
[敬以直內]’고 말씀하였으나, 또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면[以敬直內] 곧 곧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다.[人心至靈, 主宰萬變, 而非物所能宰. 故才有執持之意, 卽
是此心, 先自動了, 此程夫子每言坐忘卽是坐馳, 而其指示學者操存之道, 雖曰敬以
直內, 而又有以敬直內, 便不直矣之云也.]”라고 하였다.
조즉존(操則存):마음은 잡으면 보존된다는 말이다. 《맹자(孟子)》 〈고자 상(告
子上)〉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없어지며, 출입에 때가
없어 그 향하는 바를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마음을 두고 한 말이다.’[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謂歟!]”라고 하였다.
396 답문류편 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