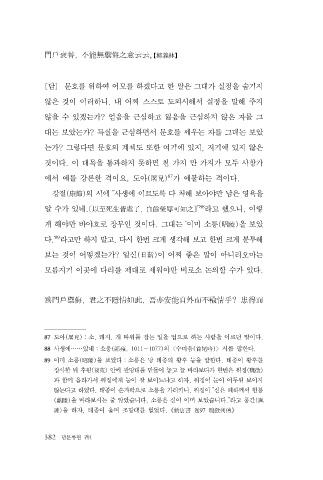Page 382 - 답문류편
P. 382
門戶衰替, 不能無禦侮之意云云。【鄭義林】
[답] 문호를 위하여 어모를 하겠다고 한 말은 그대가 실정을 숨기지
않은 것이 이러하니, 내 어찌 스스로 도외시해서 실정을 말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얻음을 근심하고 잃음을 근심하지 않은 자를 그
대는 보았는가? 득실을 근심하면서 문호를 세우는 자를 그대는 보았
는가? 그렇다면 문호의 계책도 또한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대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 가지 만 가지가 모두 사창가
에서 예를 강론한 격이요, 도아(屠兒) 가 예불하는 격이다.
강절(康節)의 시에 “사생에 이르도록 다 처해 보아야만 남은 영욕을
알 수가 있네.[以至死生皆處了, 自餘榮辱可知之]” 라고 했으니, 이렇
게 해야만 바야흐로 장부인 것이다. 그대는 ‘이미 소릉(昭陵)을 보았
다.’ 라고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보고 한번 크게 분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신(日新)이 어찌 좋은 말이 아니리오마는
모름지기 이곳에 다리를 제대로 세워야만 비로소 논의할 수가 있다.
爲門戶禦侮, 君之不隱情如此, 吾亦安能自外而不輸情乎? 患得而
도아(屠兒):소, 돼지, 개 따위를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다.
사생에……있네:소옹(邵雍, 1011~1077)의 〈수미음(首尾吟)〉 시를 말한다.
이미 소릉(昭陵)을 보았다:소릉은 당 태종의 황후 능을 말한다. 태종이 황후를
장사한 뒤 후원(後苑) 안에 관망대를 만들어 놓고 늘 바라보다가 한번은 위징(魏徵)
과 함께 올라가서 위징에게 능이 잘 보이느냐고 하자, 위징이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태종이 손가락으로 소릉을 가리키니, 위징이 “신은 폐하께서 헌릉
(獻陵)을 바라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릉은 신이 이미 보았습니다.”라고 풍간(諷
諫)을 하자, 태종이 울며 조망대를 헐었다. 《新唐書 卷97 魏徵列傳》
382 답문류편 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