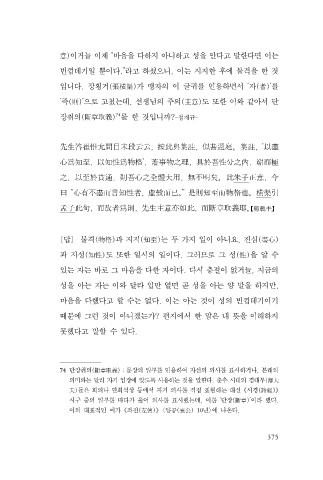Page 375 - 답문류편
P. 375
意)이거늘 이제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성을 안다고 말한다면 이는
빈껍데기일 뿐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지지한 후에 물격을 한 것
입니다. 장횡거(張橫渠)가 맹자의 이 글귀를 인용하면서 ‘자(者)’를
‘즉(則)’으로 고쳤는데, 선생님의 주의(主意)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단
장취의(斷章取義) 를 한 것입니까?-정재규-
先生答崔惟允問目末段云云, 按此與集註, 似甚逕庭。 集註, ‘以盡
心爲知至, 以知性爲物格’, 蓋事物之理, 具於吾性分之內, 竆而極
之, 以至於貫通, 則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朱子正意, 今
曰 “心有不盡而言知性者, 虛殼而已。” 是則知至而物格也。 橫渠引
孟子此句, 而改者爲則, 先生主意亦如此, 而斷章取義耶。【鄭載圭】
[답] 물격(物格)과 지지(知至)는 두 가지 일이 아니요, 진심(盡心)
과 지성(知性)도 또한 일시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 성(性)을 알 수
있는 자는 바로 그 마음을 다한 자이다. 다시 층절이 없거늘, 지금의
성을 아는 자는 이와 달라 입만 열면 곧 성을 아는 양 말을 하지만,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아는 것이 성의 빈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편지에서 한 말은 내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장취의(斷章取義):문장의 일부를 인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자기 입장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춘추 시대의 경대부(卿大
夫)들은 회의나 연회석상 등에서 자기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대신 《시경(詩經)》
시구 중의 일부를 따다가 읊어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를 ‘단장(斷章)’이라 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좌전(左傳)》 〈양공(襄公) 10년〉에 나온다.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