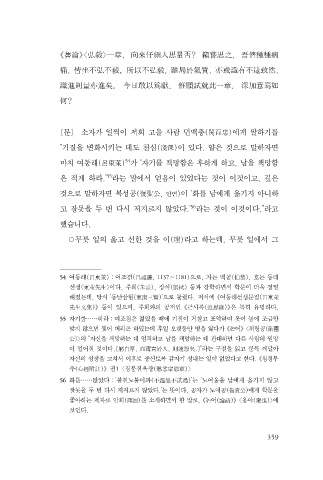Page 359 - 답문류편
P. 359
《魯論》〈弘毅〉一章, 向來仔細入思量否? 竊嘗思之, 吾儕種種病
痛, 皆坐不弘不毅。 所以不弘毅, 雖局於氣質, 亦或識有不逮致然,
識進則量亦進矣。 今日敢以爲獻, 惟願試就此一章, 深加意焉如
何?
[문] 소자가 일찍이 저희 고을 사람 민백충(閔百忠)에게 말하기를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도 천심(淺深)이 있다. 얕은 것으로 말하자면
마치 여동래(呂東萊) 가 ‘자기를 책망함은 후하게 하고, 남을 책망함
은 적게 하라.’ 라는 말에서 얻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고, 깊은
것으로 말하자면 복성공(復聖公, 안연)이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아니하
고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일의 옳고 선한 것을 이(理)라고 하는데, 무릇 일에서 그
여동래(呂東萊):여조겸(呂祖謙, 1137~1181)으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동래
선생(東萊先生)이다. 주희(朱熹), 장식(張栻) 등과 강학하면서 학문이 더욱 정밀
해졌는데, 당시 ‘동남삼현(東南三賢)’으로 불렸다. 저서에 《여동래선생문집(呂東萊
先生文集)》 등이 있으며, 주희와의 공저인 《근사록(近思錄)》은 특히 유명하다.
자기를……하라:여조겸은 젊었을 때에 기질이 거칠고 포악하여 옷이 몸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찢어 버리곤 하였는데 후일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논어》 〈위령공(衛靈
公)〉의 “자신을 책망하는 데 엄격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관대하면 다른 사람의 원망
이 멀어질 것이다.[躬自厚, 而薄責於人, 則遠怨矣.]”라는 구절을 읽고 문득 깨달아
자신의 성정을 고쳐서 이후로 종신토록 갑자기 성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심경부
주(心經附註)》 권1 〈징분질욕장(懲忿窒慾章)〉
화를……않았다:‘불천노불이과(不遷怒不貳過)’는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자가 노애공(魯哀公)에게 학문을
좋아하는 제자로 안회(顔回)를 소개하면서 한 말로, 《논어(論語)》 〈옹야(雍也)〉에
보인다.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