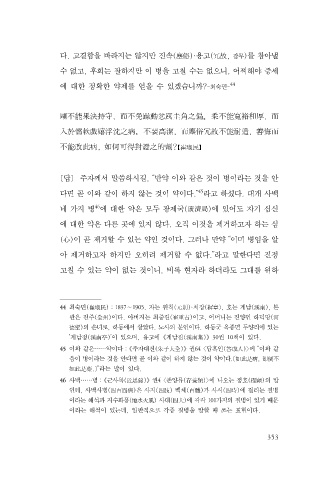Page 353 - 답문류편
P. 353
다. 고결함을 바라지는 않지만 진속(塵俗)·용고(冗故, 잡무)를 참아낼
수 없고, 후회는 잘하지만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으니, 어찌해야 증세
에 대한 정확한 약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최숙민-
剛不能果決持守, 而不免躁動忿厲圭角之偏。 柔不能寬裕和厚, 而
入於懦軟戱嬉浮沈之病。 不要高潔, 而塵俗冗故不能耐遣, 善悔而
不能改此病, 如何可得對證之的劑?【崔琡民】
[답] 주자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이와 같은 것이 병이라는 것을 안
다면 곧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약이다.” 라고 하셨다. 대개 사백
네 가지 병 에 대한 약은 모두 광제국(廣濟局)에 있어도 자기 심신
에 대한 약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오직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심
(心)이 곧 제거할 수 있는 약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미 병임을 알
아 제거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진정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것이니, 비록 현자라 하더라도 그대를 위하
최숙민(崔琡民):1837~1905. 자는 원칙(元則)·치장(穉章), 호는 계남(溪南), 본
관은 전주(全州)이다. 아버지는 최중길(崔重吉)이고, 어머니는 진양인 하덕망(河
德望)의 손녀로, 하동에서 살았다. 노사의 문인이다.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에 있는
‘계남정(溪南亭)’이 있으며, 유고에 《계남집(溪南集)》 30권 10책이 있다.
이와 같은……약이다:《주자대전(朱子大全)》 권64 〈답혹인(答或人)〉에 “이와 같
음이 병이라는 것을 안다면 곧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약이다.[如此是病, 卽便不
如此是藥.]”라는 말이 있다.
사백……병:《근사록(近思錄)》 권4 〈존양류(存養類)〉에 나오는 정호(程顥)의 말
인데, 사백사병(四百四病)은 사지(四肢) 백체(百體)가 사시(四時)에 걸리는 질병
이라는 해석과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에 각각 101가지의 질병이 있기 때문
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질병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