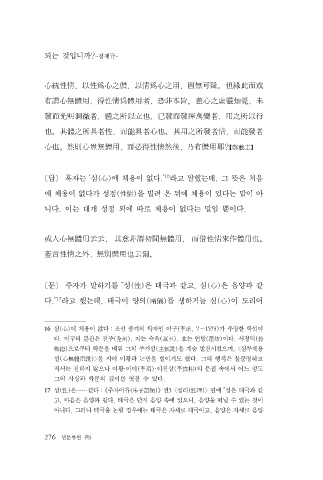Page 276 - 답문류편
P. 276
되는 것입니까?-정재규-
心統性情, 以性爲心之體, 以情爲心之用, 固無可疑。 但緣此而或
有謂心無體用, 得性情爲體用者, 恐非本旨。 蓋心之虛靈知覺, 未
發而光明洞徹者, 體之所以立也, 已發而發揮萬變者, 用之所以行
也。 其體之所具者性, 而能具者心也。 其用之所發者情, 而能發者
心也。 然則心豈無體用, 而必得性情然後, 乃有體用耶?【鄭載圭】
[답] 혹자는 ‘심(心)에 체용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 뜻은 처음
에 체용이 없다가 성정(性情)을 빌려 온 뒤에 체용이 있다는 말이 아
니다. 이는 대개 성정 외에 따로 체용이 없다는 말일 뿐이다.
或人心無體用云云, 其意非謂初間無體用, 而借性情來作體用也。
蓋言性情之外, 無別體用也云爾。
[문] 주자가 말하기를 “성(性)은 태극과 같고, 심(心)은 음양과 같
다.” 라고 했는데, 태극이 양의(兩儀)를 생하거늘 심(心)이 도리어
심(心)에 체용이 없다:조선 중기의 학자인 이구(李球, ?~1573)가 주장한 학설이
다. 이구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숙옥(叔玉), 호는 연방(蓮坊)이다. 서경덕(徐
敬德)으로부터 학문을 배워 그의 주기설(主氣說)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심무체용
설(心無體用說)〉을 지어 이황과 논변을 벌이기도 했다. 그의 행적은 불분명하고
저서는 전하지 않으나 이황·이이(李珥)·이진상(李震相)의 문집 속에서 어느 정도
그의 사상과 학문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성(性)은……같다:《주자어류(朱子語類)》 권5 〈성리(性理)〉 편에 “성은 태극과 같
고, 마음은 음양과 같다. 태극은 단지 음양 속에 있으니, 음양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태극을 논할 경우에는 태극은 자체로 태극이고, 음양은 자체로 음양
276 답문류편 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