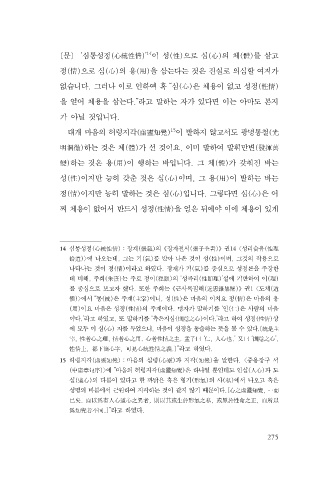Page 275 - 답문류편
P. 275
[문] ‘심통성정(心統性情)’ 이 성(性)으로 심(心)의 체(體)를 삼고
정(情)으로 심(心)의 용(用)을 삼는다는 것은 진실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혹 “심(心)은 체용이 없고 성정(性情)
을 얻어 체용을 삼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아마도 본지
가 아닐 것입니다.
대개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 이 발하지 않고서도 광명통철(光
明洞徹)하는 것은 체(體)가 선 것이요, 이미 발하여 발휘만변(發揮萬
變)하는 것은 용(用)이 행하는 바입니다. 그 체(體)가 갖춰진 바는
성(性)이지만 능히 갖춘 것은 심(心)이며, 그 용(用)이 발하는 바는
정(情)이지만 능히 발하는 것은 심(心)입니다. 그렇다면 심(心)은 어
찌 체용이 없어서 반드시 성정(性情)을 얻은 뒤에야 이에 체용이 있게
심통성정(心統性情):장재(張載)의 《장자전서(張子全書)》 권14 〈성리습유(性理
拾遺)〉에 나오는데, 그는 기(氣)를 받아 나온 것이 성(性)이며, 그것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情)이라고 하였다. 장재가 기(氣)를 중심으로 성정론을 주장한
데 비해, 주희(朱熹)는 주로 정이(程頤)의 ‘성즉리(性卽理)’설에 기반하여 이(理)
를 중심으로 보고자 했다. 또한 주희는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1 〈도체(道
體)〉에서 “통(統)은 주재(主宰)이니, 성(性)은 마음의 이치요 정(情)은 마음의 용
(用)이요 마음은 성정(性情)의 주재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인(仁)은 사람의 마음
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라고 하여 성정(性情)상
에 모두 이 심(心) 자를 두었으니, 마음이 성정을 통솔하는 뜻을 볼 수 있다.[統是主
宰, 性者心之理, 情者心之用. 心者性情之主. 孟子曰 ‘仁, 人心也.’ 又曰 ‘惻隱之心’,
性情上, 都下箇心字, 可見心統性情之義.]”라고 하였다.
허령지각(虛靈知覺):마음의 심령(心靈)과 지각(知覺)을 말한다. 〈중용장구 서
(中庸章句序)〉에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인데도 인심(人心)과 도
심(道心)의 다름이 있다고 한 까닭은 혹은 형기(形氣)의 사(私)에서 나오고 혹은
성명의 바름에서 근원하여 지각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心之虛靈知覺, 一而
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
爲知覺者不同.]”라고 하였다.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