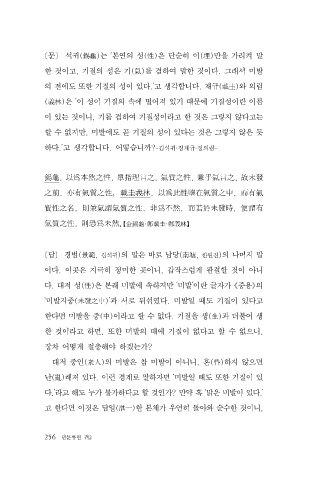Page 256 - 답문류편
P. 256
[문] 석귀(錫龜)는 ‘본연의 성(性)은 단순히 이(理)만을 가리켜 말
한 것이고, 기질의 성은 기(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 그래서 미발
의 전에도 또한 기질의 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규(載圭)와 의림
(義林)은 ‘이 성이 기질의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질성이란 이름
이 있는 것이니, 기를 겸하여 기질성이라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발에도 곧 기질의 성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김석귀·정재규·정의림-
錫龜, 以爲本然之性, 單指理言之, 氣質之性, 兼乎氣言之, 故未發
之前, 亦有氣質之性。 載圭義林, 以爲此性墮在氣質之中, 而有氣
質性之名, 則兼氣謂氣質之性, 非爲不然, 而若於未發時, 便謂有
氣質之性, 則恐爲未然。【金錫龜·鄭載圭·鄭義林】
[답] 경범(景範, 김석귀)의 말은 바로 남당(南塘, 한원진)의 나머지 말
이다. 이곳은 지극히 정미한 곳이니, 갑작스럽게 판결할 것이 아니
다. 대저 성(性)은 본래 미발에 속하지만 ‘미발’이란 글자가 《중용》의
‘미발지중(未發之中)’과 서로 뒤섞였다. 미발일 때도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미발을 중(中)이라고 할 수 없다. 기질을 생(生)과 더불어 생
한 것이라고 하면, 또한 미발의 때에 기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장차 어떻게 절충해야 하겠는가?
대저 중인(衆人)의 미발은 참 미발이 아니니, 혼(昏)하지 않으면
난(亂)해져 있다. 이런 경계로 말하자면 ‘미발일 때도 또한 기질이 있
다.’라고 해도 누가 불가하다고 할 것인가? 만약 혹 ‘맑은 미발이 있다.’
고 한다면 이것은 담일(湛一)한 본체가 우연히 돌아와 순수한 것이니,
256 답문류편 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