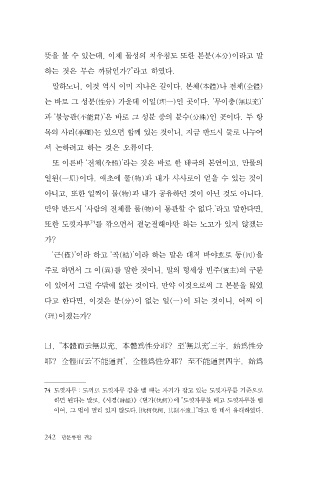Page 242 - 답문류편
P. 242
뜻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물성의 치우침도 또한 본분(本分)이라고 말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였다.
말하노니, 이것 역시 이미 지나온 길이다. 본체(本體)나 전체(全體)
는 바로 그 성분(性分) 가운데 이일(理一)인 곳이다. ‘무이충(無以充)’
과 ‘불능관(不能貫)’은 바로 그 성분 중의 분수(分殊)인 곳이다. 두 항
목의 사리(事理)는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이니, 지금 반드시 둘로 나누어
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오류이다.
또 이른바 ‘전체(全體)’라는 것은 바로 한 태극의 본연이고, 만물의
일원(一原)이다. 애초에 물(物)과 내가 사사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찍이 물(物)과 내가 공유하던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만약 반드시 ‘사람의 전체를 물(物)이 통관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또한 도낏자루 를 깎으면서 곁눈질해야만 하는 노고가 있지 않겠는
가?
‘근(僅)’이라 하고 ‘곡(梏)’이라 하는 말은 대저 바야흐로 동(同)을
주로 하면서 그 이(異)를 말한 것이니, 말의 형세상 빈주(賓主)의 구분
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으로써 그 본분을 잃었
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分)이 없는 일(一)이 되는 것이니, 어찌 이
(理)이겠는가?
曰, “本體而云無以充, 本體爲性分耶? 至‘無以充’三字, 始爲性分
耶? 全體而云‘不能通貫’, 全體爲性分耶? 至不能通貫四字, 始爲
도낏자루:도끼로 도낏자루 감을 벨 때는 자기가 잡고 있는 도낏자루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말로, 《시경(詩經)》 〈벌가(伐柯)〉에 “도낏자루를 베고 도낏자루를 벰
이여, 그 법이 멀리 있지 않도다.[伐柯伐柯, 其則不遠.]”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242 답문류편 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