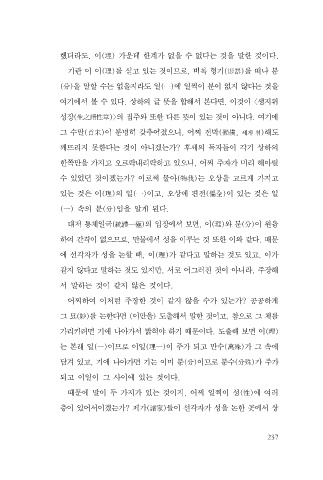Page 237 - 답문류편
P. 237
했더라도, 이(理) 가운데 한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기란 이 이(理)를 싣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형기(形器)를 떠나 분
(分)을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一)에 일찍이 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상하의 글 뜻을 합해서 본다면, 이것이 〈생지위
성장(生之謂性章)〉의 집주와 또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그 수말(首末)이 분명히 갖추어졌으니, 어찌 전박(攧撲, 세게 침)해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후세의 독자들이 각기 상하의
한쪽만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니, 어찌 주자가 미리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겠는가? 이로써 물아(物我)는 오상을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理)의 일(一)이고, 오상에 편전(偏全)이 있는 것은 일
(一) 속의 분(分)임을 알게 된다.
대저 통체일극(統體一極)의 입장에서 보면, 이(理)와 분(分)이 원융
하여 간격이 없으므로, 만물에서 성을 이루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때문
에 선각자가 성을 논할 때, 이(理)가 같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이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주장해
서 말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이다.
어찌하여 이처럼 주장한 것이 같지 않을 수가 있는가? 공공하게
그 묘(妙)를 논한다면 (이만을) 도출해서 말한 것이고, 참으로 그 체를
가리키려면 기에 나아가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도출해 보면 이(理)
는 본래 일(一)이므로 이일(理一)이 주가 되고 만수(萬殊)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기에 나아가면 기는 이미 분(分)이므로 분수(分殊)가 주가
되고 이일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 어찌 일찍이 성(性)에 여러
층이 있어서이겠는가? 제가(諸家)들이 선각자가 성을 논한 곳에서 상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