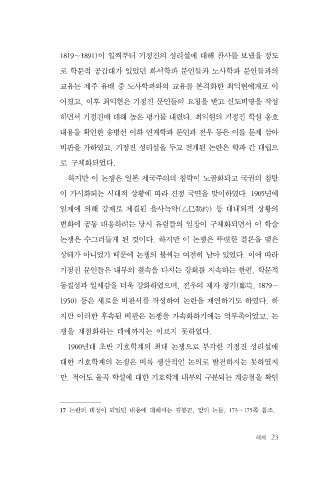Page 23 - 답문류편
P. 23
1819~1891)이 일찍부터 기정진의 성리설에 대해 찬사를 보냈을 정도
로 학문적 공감대가 있었던 화서학파 문인들과 노사학파 문인들과의
교유는 제주 유배 중 노사학파와의 교유를 본격화한 최익현에게로 이
어졌고, 이후 최익현은 기정진 문인들의 요청을 받고 신도비명을 작성
하면서 기정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최익현의 기정진 학설 옹호
내용을 확인한 송병선 이하 연재학파 문인과 전우 등은 이를 문제 삼아
비판을 가하였고, 기정진 성리설을 두고 전개된 논란은 학파 간 대립으
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국권의 침탈
이 가시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진정 국면을 맞이하였다. 1905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 등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려는 당시 유림들의 입장이 구체화되면서 이 학술
논쟁은 수그러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은 뚜렷한 결론을 맺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기정진 문인들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강회를 지속하는 한편, 학문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전우의 제자 정기(鄭琦, 1879~
1950) 등은 새로운 비판서를 작성하여 논란을 재연하기도 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후속된 비판은 논쟁을 가속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논
쟁을 재점화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1900년대 초반 기호학계의 최대 논쟁으로 부각한 기정진 성리설에
대한 기호학계의 논쟁은 비록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지
만, 적어도 율곡 학설에 대한 기호학계 내부의 구분되는 계승점을 확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김봉곤, 앞의 논문, 173~175쪽 참조.
해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