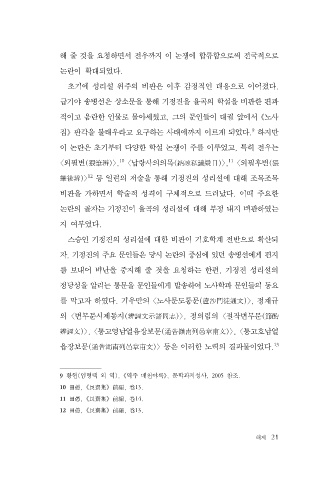Page 21 - 답문류편
P. 21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우까지 이 논쟁에 합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대되었다.
초기에 성리설 위주의 비판은 이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송병선은 상소문을 통해 기정진을 율곡의 학설을 비판한 편파
적이고 음란한 인물로 몰아세웠고, 그의 문인들이 대궐 앞에서 《노사
집》 판각을 불태우라고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초기부터 다양한 학설 논쟁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전우는
〈외필변(猥筆辨)〉, 〈납량사의의목(納凉私議疑目)〉, 〈외필후변(猥
筆後辨)〉 등 일련의 저술을 통해 기정진의 성리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면서 학술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때 주요한
논란의 골자는 기정진이 율곡의 성리설에 대해 부정 내지 비판하였는
지 여부였다.
스승인 기정진의 성리설에 대한 비판이 기호학계 전반으로 확산되
자, 기정진의 주요 문인들은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송병선에게 편지
를 보내어 비난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정진 성리설의
정당성을 알리는 통문을 문인들에게 발송하여 노사학파 문인들의 동요
를 막고자 하였다. 기우만의 〈노사문도통문(蘆沙門徒通文)〉, 정재규
의 〈변무문시제동지(辨誣文示諸同志)〉, 정의림의 〈절작변무문(節酌
辨誣文)〉, 〈통고영남열읍장보문(通告嶺南列邑章甫文)〉, 〈통고호남열
읍장보문(通告湖南列邑章甫文)〉 등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황현(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문학과지성사, 2005 참조.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田愚, 《艮齋集》 前編, 卷14.
田愚, 《艮齋集》 前編, 卷13.
해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