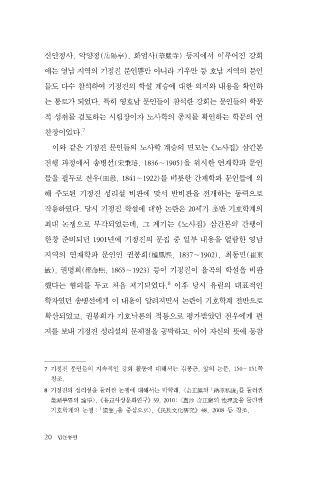Page 20 - 답문류편
P. 20
신안정사, 악양정(岳陽亭), 화엄사(華嚴寺) 등지에서 이루어진 강회
에는 영남 지역의 기정진 문인뿐만 아니라 기우만 등 호남 지역의 문인
들도 다수 참석하여 기정진의 학설 계승에 대한 의지와 내용을 확인하
는 통로가 되었다. 특히 영호남 문인들이 참석한 강회는 문인들의 학문
적 성취를 검토하는 시험장이자 노사학의 종지를 확인하는 학문의 연
찬장이었다.
이와 같은 기정진 문인들의 노사학 계승의 면모는 《노사집》 삼간본
진행 과정에서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을 위시한 연재학파 문인
들을 필두로 전우(田愚, 1841~1922)를 비롯한 간재학파 문인들에 의
해 주도된 기정진 성리설 비판에 맞서 반비판을 전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기정진 학설에 대한 논란은 20세기 초반 기호학계의
최대 논쟁으로 부각되었는데, 그 계기는 《노사집》 삼간본의 간행이
한창 준비되던 1901년에 기정진의 문집 중 일부 내용을 열람한 영남
지역의 연재학파 문인인 권봉희(權鳳熙, 1837~1902), 최동민(崔東
敏), 권명희(權命熙, 1865~1923) 등이 기정진이 율곡의 학설을 비판
했다는 혐의를 두고 처음 제기되었다. 이후 당시 유림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송병선에게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기호학계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권봉희가 기호낙론의 적통으로 평가받았던 전우에게 편
지를 보내 기정진 성리설의 문제점을 공박하고, 이어 자신의 뜻에 동참
기정진 문인들의 지속적인 강회 활동에 대해서는 김봉곤, 앞의 논문, 150~151쪽
참조.
기정진의 성리설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박학래, 〈奇正鎭의 「納凉私議」를 둘러싼
畿湖學界의 論爭〉, 《유교사상문화연구》 39, 2010: 〈蘆沙 奇正鎭의 性理說을 둘러싼
기호학계의 논쟁:「猥筆」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 48, 2008 등 참조.
20 답문류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