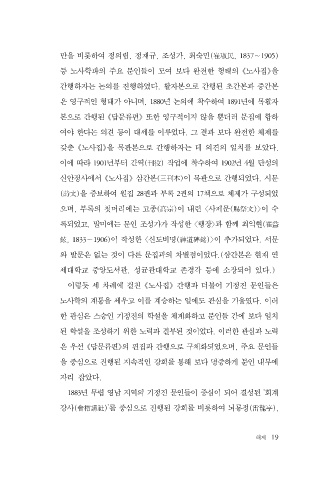Page 19 - 답문류편
P. 19
만을 비롯하여 정의림, 정재규, 조성가, 최숙민(崔琡民, 1837~1905)
등 노사학파의 주요 문인들이 모여 보다 완전한 형태의 《노사집》을
간행하자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활자본으로 간행된 초간본과 중간본
은 영구적인 형태가 아니며, 1880년 논의에 착수하여 1891년에 목활자
본으로 간행된 《답문류편》 또한 영구적이지 않을 뿐더러 문집에 합하
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 결과 보다 완전한 체제를
갖춘 《노사집》을 목판본으로 간행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1901년부터 간역(刊役) 작업에 착수하여 1902년 4월 단성의
신안정사에서 《노사집》 삼간본(三刊本)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시문
(詩文)을 증보하여 원집 28권과 부록 2권의 17책으로 체제가 구성되었
으며, 부록의 첫머리에는 고종(高宗)이 내린 〈사제문(賜祭文)〉이 수
록되었고, 말미에는 문인 조성가가 작성한 〈행장〉과 함께 최익현(崔益
鉉, 1833~1906)이 작성한 〈신도비명(神道碑銘)〉이 추가되었다. 서문
와 발문은 없는 것이 다른 문집과의 차별점이었다.(삼간본은 현재 연
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렇듯 세 차례에 걸친 《노사집》 간행과 더불어 기정진 문인들은
노사학의 계통을 세우고 이를 계승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
한 관심은 스승인 기정진의 학설을 체계화하고 문인들 간에 보다 일치
된 학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결부된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
은 우선 《답문류편》의 편집과 간행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주요 문인들
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속적인 강회를 통해 보다 명증하게 문인 내부에
자리 잡았다.
1883년 무렵 영남 지역의 기정진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회계
강사(會稽講社)’를 중심으로 진행된 강회를 비롯하여 뇌룡정(雷龍亭),
해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