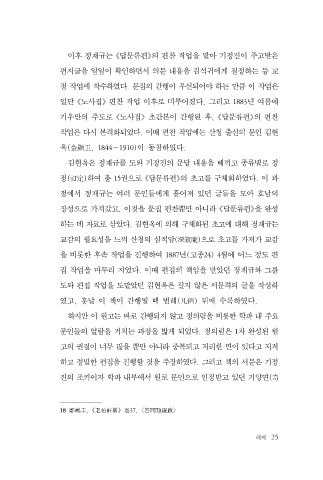Page 25 - 답문류편
P. 25
이후 정재규는 《답문류편》의 편찬 작업을 맡아 기정진이 주고받은
편지글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의문 내용을 김석귀에게 질정하는 등 교
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문집의 간행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 작업은
일단 《노사집》 편찬 작업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1883년 여름에
기우만의 주도로 《노사집》 초간본이 간행된 후, 《답문류편》의 편찬
작업은 다시 본격화되었다. 이때 편찬 작업에는 산청 출신의 문인 김현
옥(金顯玉, 1844~1910)이 동참하였다.
김현옥은 정재규를 도와 기정진의 문답 내용을 베끼고 종류별로 정
정(訂定)하여 총 15권으로 《답문류편》의 초고를 구체화하였다. 이 과
정에서 정재규는 여러 문인들에게 흩어져 있던 글들을 모아 호남의
장성으로 가져갔고, 이것을 문집 편찬뿐만 아니라 《답문류편》을 완성
하는 데 자료로 삼았다. 김현옥에 의해 구체화된 초고에 대해 정재규는
교감의 필요성을 느껴 산청의 심적암(深寂庵)으로 초고를 가져가 교감
을 비롯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 1887년(고종24) 4월에 어느 정도 편
집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때 편집의 책임을 맡았던 정재규와 그를
도와 편집 작업을 도맡았던 김현옥은 길지 않은 서문격의 글을 작성하
였고, 훗날 이 책이 간행될 때 범례(凡例) 뒤에 수록하였다.
하지만 이 원고는 바로 간행되지 않고 정의림을 비롯한 학파 내 주요
문인들의 열람을 거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정의림은 1차 완성된 원
고의 권질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고 지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
하고 정밀한 편집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책의 서문은 기정
진의 조카이자 학파 내부에서 원로 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던 기양연(奇
鄭載圭, 《老柏軒集》 卷37, 〈答問類編跋〉
해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