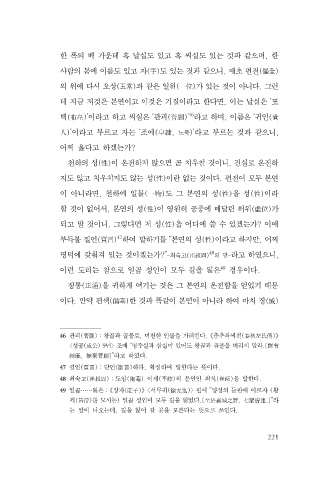Page 221 - 답문류편
P. 221
한 폭의 베 가운데 혹 날실도 있고 혹 씨실도 있는 것과 같으며, 한
사람의 몸에 이름도 있고 자(字)도 있는 것과 같으니, 애초 편전(偏全)
의 위에 다시 오상(五常)과 같은 일위(一位)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지금 저것은 본연이고 이것은 기질이라고 한다면, 이는 날실은 ‘포
백(布帛)’이라고 하고 씨실은 ‘관괴(菅蒯)’ 라고 하며, 이름은 ‘귀인(貴
人)’이라고 부르고 자는 ‘조예(皁隷, 노복)’라고 부르는 것과 같으니,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천하의 성(性)이 온전하지 않으면 곧 치우친 것이니, 진실로 온전하
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는 성(性)이란 없는 것이다. 편전이 모두 본연
이 아니라면, 천하에 일물(一物)도 그 본연의 성(性)을 성(性)이라
할 것이 없어서, 본연의 성(性)이 영원히 공중에 매달린 허위(虛位)가
되고 말 것이니, 그렇다면 저 성(性)을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 이에
부득불 질언(質言) 하여 말하기를 “본연의 성(性)이라고 하지만, 어찌
명덕에 갖춰져 있는 것이겠는가?”-최숙고(崔叔固) 의 말-라고 하였으니,
이런 도리는 참으로 일곱 성인이 모두 길을 잃은 경우이다.
정통(正通)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본연의 온전함을 얻었기 때문
이다. 만약 편색(偏塞)한 것과 똑같이 본연이 아니라 하여 마치 장(臧)
관괴(菅蒯):왕골과 골풀로, 미천한 인물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9년〉 조에 “명주실과 삼실이 있어도 왕골과 골풀을 버리지 말라.[雖有
絲麻, 無棄菅蒯]”라고 하였다.
질언(質言):단언(斷言)하다, 확정하여 말한다는 뜻이다.
최숙고(崔叔固):도암(陶菴) 이재(李縡)의 문인인 최석(崔祏)을 말한다.
일곱……잃은:《장자(莊子)》 〈서무귀(徐无鬼)〉 편에 “양성의 들판에 이르자 (황
제(黃帝)를 모시는) 일곱 성인이 모두 길을 잃었다.[至於襄城之野, 七聖皆迷.]”라
는 말이 나오는데, 길을 잃어 갈 곳을 모른다는 뜻으로 쓰인다.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