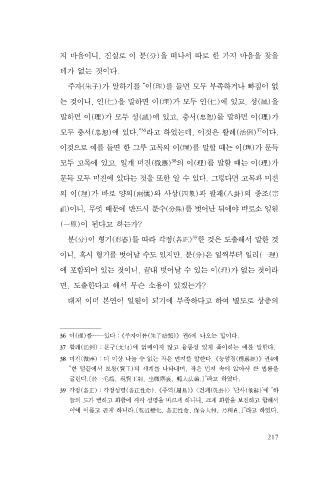Page 217 - 답문류편
P. 217
지 마음이니, 진실로 이 분(分)을 떠나서 따로 한 가지 마음을 찾을
데가 없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이(理)를 들면 모두 부족하거나 빠짐이 없
는 것이니, 인(仁)을 말하면 이(理)가 모두 인(仁)에 있고, 성(誠)을
말하면 이(理)가 모두 성(誠)에 있고, 충서(忠恕)를 말하면 이(理)가
모두 충서(忠恕)에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활례(活例) 이다.
이것으로 예를 들면 한 그루 고목의 이(理)를 말할 때는 이(理)가 문득
모두 고목에 있고, 일개 미진(微塵) 의 이(理)를 말할 때는 이(理)가
문득 모두 미진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목과 미진
의 이(理)가 바로 양의(兩儀)와 사상(四象)과 팔괘(八卦)의 종조(宗
祖)이니, 무엇 때문에 반드시 분수(分殊)를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일원
(一原)이 된다고 하는가?
분(分)이 형기(形器)를 따라 각정(各正) 한 것은 도출해서 말한 것
이니, 혹시 형기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분(分)은 일찍부터 일리(一理)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끝내 벗어날 수 있는 이(理)가 없는 것이라
면, 도출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저 이미 본연이 일원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별도로 상층의
이(理)를……있다:《주자어류(朱子語類)》 권6에 나오는 말이다.
활례(活例):문구(文句)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풀이하는 예를 말한다.
미진(微塵):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먼지를 말한다. 《능엄경(楞嚴經)》 권4에
“한 털끝에서 보왕(寶王)의 세계를 나타내며, 작은 먼지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린다.[於一毛端, 現寶王刹, 坐微塵裏, 轉大法輪.]”라고 하였다.
각정(各正):각정성명(各正性命). 《주역(周易)》 〈건괘(乾卦)〉 ‘단사(彖辭)’에 “하
늘의 도가 변하고 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나니, 크게 화함을 보전하고 합해서
이에 이롭고 곧게 하니라.[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 乃利貞.]”라고 하였다.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