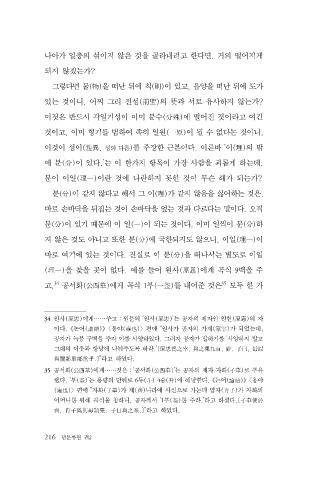Page 216 - 답문류편
P. 216
나아가 일층의 섞이지 않은 것을 골라내려고 한다면, 거의 떨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물(物)을 떠난 뒤에 칙(則)이 있고, 음양을 떠난 뒤에 도가
있는 것이니, 어찌 그리 전성(前聖)의 뜻과 서로 유사하지 않는가?
이것은 반드시 각일기성이 이미 분수(分殊)에 떨어진 것이라고 여긴
것이고, 이미 형기를 범하여 족히 일원(一原)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니,
이것이 성이(性異, 성의 다름)를 주장한 근본이다. 이른바 ‘이(理)의 밖
에 분(分)이 있다.’는 이 한가지 항목이 가장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분이 이일(理一)이란 것에 나란하지 못한 것이 무슨 해가 되는가?
분(分)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이(理)가 같지 않음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 손바닥을 엎는 것과 다르다는 말이다. 오직
분(分)이 있기 때문에 이 일(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일찍이 분(分)하
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한 분(分)에 국한되지도 않으니, 이일(理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진실로 이 분(分)을 떠나서는 별도로 이일
(理一)을 찾을 곳이 없다. 예를 들어 원사(原思)에게 곡식 9백을 주
고, 공서화(公西華)에게 곡식 1부(一釜)를 내어준 것은 모두 한 가
원사(原思)에게……주고:원문의 ‘원사(原思)’는 공자의 제자인 원헌(原憲)의 자
이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편에 “원사가 공자의 가재(家宰)가 되었는데,
공자가 녹봉 구백을 주자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그대의 이웃과 향당에 나눠주도록 하라.’[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子曰, 毋以
與爾鄰里鄕黨乎.]”라고 하였다.
공서화(公西華)에게……것은:‘공서화(公西華)’는 공자의 제자 자화(子華)로 부유
했다. ‘부(釜)’는 용량의 단위로 6두(斗) 4승(升)에 해당한다. 《논어(論語)》 〈옹야
(雍也)〉 편에 “자화(子華)가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염자(冉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청하니, 공자께서 ‘1부(釜)를 주라.’라고 하셨다.[子華使於
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與之釜.]”라고 하였다.
216 답문류편 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