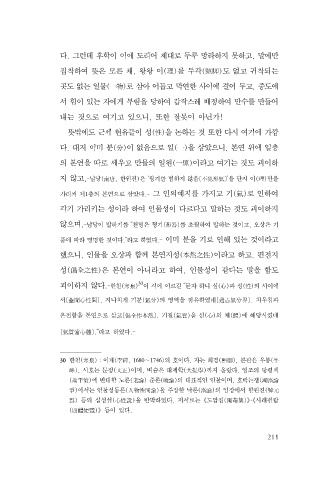Page 211 - 답문류편
P. 211
다. 그런데 후학이 이에 도리어 제대로 두루 망라하지 못하고, 말에만
집착하여 뜻은 모른 채, 왕왕 이(理)를 두각(頭脚)도 없고 귀착되는
곳도 없는 일물(一物)로 삼아 어둡고 막연한 사이에 걸어 두고, 중도에
서 힘이 있는 자에게 부림을 당하여 갑작스레 배정하여 만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
뜻밖에도 근세 현유들이 성(性)을 논하는 것 또한 다시 여기에 가깝
다. 대저 이미 분(分)이 없음으로 일(一)을 삼았으니, 본연 위에 일층
의 본연을 따로 세우고 만물의 일원(一原)이라고 여기는 것도 괴이하
지 않고,-남당(南唐, 한원진)은 ‘형기를 범하지 않음[不犯形氣]’을 단지 이(理)만을
가리켜 제1층의 본연으로 삼았다.- 그 인의예지를 가지고 기(氣)로 인하여
각기 가리키는 성이라 하여 인물성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괴이하지
않으며,-남당이 말하기를 “천명은 형기(形器)를 초월하여 말하는 것이고, 오상은 기
품에 따라 명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분을 기로 인해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인물을 오상과 함께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고 하고, 편전지
성(偏全之性)은 본연이 아니라고 하여, 인물성이 같다는 말을 함도
괴이하지 않다.-한천(寒泉) 이 시에 이르길 “듣자 하니 심(心)과 성(性)의 사이에
서[蓋聞心性間], 지나치게 기분(氣分)의 영역을 점유하였네[過占氣分界]. 치우침과
온전함을 본연으로 삼고[偏全作本然], 기질(氣質)을 심(心)의 체(體)에 해당시켰네
[氣質當心體].”라고 하였다.-
한천(寒泉):이재(李縡, 1680~1746)의 호이다. 자는 희경(煕卿), 본관은 우봉(牛
峰),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벼슬은 대제학(大提學)까지 올랐다. 영조의 탕평책
(蕩平策)에 반대한 노론(老論) 준론(峻論)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호락논쟁(湖洛論
爭)에서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낙론(洛論)의 입장에서 한원진(韓元
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였다. 저서로는 《도암집(陶菴集)》·《사례편람
(四禮便覽)》 등이 있다.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