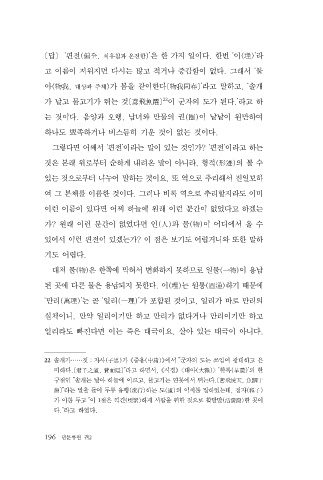Page 196 - 답문류편
P. 196
[답] ‘편전(偏全, 치우침과 온전함)’은 한 가지 일이다. 한번 ‘이(理)’라
고 이름이 지워지면 다시는 많고 적거나 증감함이 없다. 그래서 ‘물
아(物我, 대상과 주체)가 봄을 같이한다[物我同春]’라고 말하고, ‘솔개
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鳶飛魚躍] 이 군자의 도가 된다.’라고 하
는 것이다. 음양과 오행, 남녀와 만물의 권(圈)이 낱낱이 원만하여
하나도 뾰족하거나 비스듬히 기운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편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 ‘편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위로부터 순하게 내려온 말이 아니라, 형적(形迹)의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나누어 말하는 것이요, 또 역으로 추리해서 진일보하
여 그 본체를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역으로 추리할지라도 이미
이런 이름이 있다면 어찌 하늘에 원래 이런 분간이 없었다고 하겠는
가? 원래 이런 분간이 없었다면 인(人)과 물(物)이 어디에서 올 수
있어서 이런 편전이 있겠는가? 이 점은 보기도 어렵거니와 또한 말하
기도 어렵다.
대저 물(物)은 한쪽에 막혀서 변화하지 못하므로 일물(一物)이 용납
된 곳에 다른 물은 용납되지 못한다. 이(理)는 원통(圓通)하기 때문에
‘만리(萬理)’는 곧 ‘일리(一理)’가 포함된 것이고, 일리가 바로 만리의
실체이니, 만약 일리이기만 하고 만리가 없다거나 만리이기만 하고
일리라도 빠진다면 이는 죽은 태극이요, 살아 있는 태극이 아니다.
솔개가……것:자사(子思)가 《중용(中庸)》에서 “군자의 도는 쓰임이 광대하고 은
미하다.[君子之道, 費而隱]”라고 하면서, 《시경》 〈대아(大雅)〉 ‘한록(旱麓)’의 한
구절인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다.[鳶飛戾天, 魚躍于
淵]”라는 말을 들어 두루 유행(流行)하는 도(道)의 이치를 말하였는데, 정자(程子)
가 이를 두고 “이 1절은 끽긴(喫緊)하게 사람을 위한 것으로 활발발(活潑潑)한 곳이
다.”라고 하였다.
196 답문류편 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