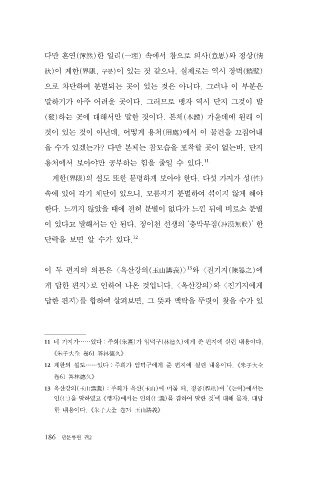Page 186 - 답문류편
P. 186
다만 혼연(渾然)한 일리(一理) 속에서 참으로 의사(意思)와 정상(情
狀)이 계한(界限, 구분)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역시 장벽(牆壁)
으로 차단하여 분별되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다. 그러므로 맹자 역시 단지 그것이 발
(發)하는 곳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본체(本體) 가운데에 원래 이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용처(用處)에서 이 물건을 끄집어내
올 수가 있겠는가? 다만 본체는 참모습을 포착할 곳이 없는바, 단지
용처에서 보아야만 공부하는 힘을 줄일 수 있다.
계한(界限)의 설도 또한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다섯 가지가 성(性)
속에 있어 각기 체단이 있으니, 모름지기 분별하여 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 느끼지 않았을 때에 전혀 분별이 없다가 느낀 뒤에 비로소 분별
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이천 선생의 ‘충막무짐(冲漠無眹)’ 한
단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두 편지의 의론은 〈옥산강의(玉山講義)〉 와 〈진기지(陳器之)에
게 답한 편지〉로 인하여 나온 것입니다. 〈옥산강의〉와 〈진기지에게
답한 편지〉를 합하여 살펴보면, 그 뜻과 맥락을 뚜렷이 찾을 수가 있
네 가지가……있다:주희(朱熹)가 임덕구(林德久)에게 준 편지에 실린 내용이다.
《朱子大全 卷61 答林德久》
계한의 설도……있다:주희가 임덕구에게 준 편지에 실린 내용이다. 《朱子大全
卷61 答林德久》
옥산강의(玉山講義):주희가 옥산(玉山)에 머물 때, 정공(程珙)이 ‘《논어》에서는
인(仁)을 말하였고 《맹자》에서는 인의(仁義)를 겸하여 말한 것’에 대해 묻자, 대답
한 내용이다. 《朱子大全 卷74 玉山講義》
186 답문류편 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