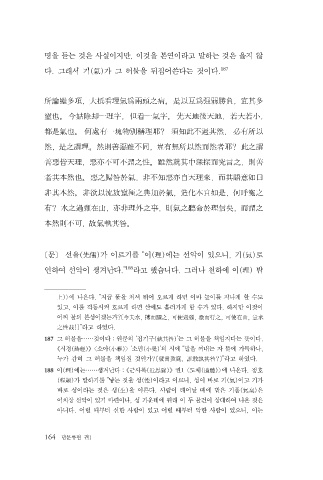Page 164 - 답문류편
P. 164
명을 듣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본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
다. 그래서 기(氣)가 그 허물을 뒤집어쓴다는 것이다.
所論雖多項, 大抵看理氣爲兩頭之病。 是以互爲強弱勝負, 宜其多
窒也。 今姑除却一理字, 但看一氣字。 先天地後天地, 若大若小,
都是氣也。 何處有一塊物別稱理耶? 須知此不過其然, 必有所以
然, 是之謂理。 然則善惡雖不同, 豈有無所以然而然者耶? 此之謂
善惡皆天理, 惡亦不可不謂之性。 雖然就其中深探而究言之, 則善
者其本然也。 惡之歸咎於氣, 非不知惡亦自天理來, 而其語意如曰
非其本然。 非欲以流放竄殛之典加於氣, 造化本自如是, 何呼寃之
有? 水之過顙在山, 亦非理外之事, 則氣之聽命於理信矣, 而謂之
本然則不可, 故氣執其咎。
[문]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이(理)에는 선악이 있으니, 기(氣)로
인하여 선악이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이(理) 밖
上)〉에 나온다. “지금 물을 쳐서 튀어 오르게 하면 이마 높이를 지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격동시켜 흐르게 하면 산에도 흘러가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之, 可使在山, 豈水
之性哉!]”라고 하였다.
그 허물을……것이다:원문의 ‘집기구(執其咎)’는 그 허물을 책임지다는 뜻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小旻)’의 시에 “말을 꺼내는 자 뜰에 가득하나,
누가 감히 그 허물을 책임질 것인가?[發言盈庭, 誰敢執其咎?]”라고 하였다.
이(理)에는……생겨난다:《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體)〉에 나온다. 정호
(程顥)가 말하기를 “낳는 것을 성(性)이라고 이르니, 성이 바로 기(氣)이고 기가
바로 성이라는 것은 생(生)을 이른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받은 기품(氣稟)은
이치상 선악이 있기 마련이나, 성 가운데에 원래 이 두 물건이 상대하여 나온 것은
아니다. 어릴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어릴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164 답문류편 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