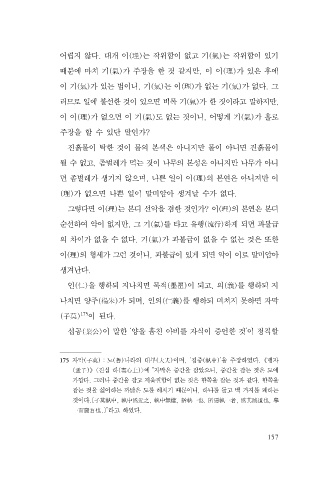Page 157 - 답문류편
P. 157
어렵지 않다. 대개 이(理)는 작위함이 없고 기(氣)는 작위함이 있기
때문에 마치 기(氣)가 주장을 한 것 같지만, 이 이(理)가 있은 후에
이 기(氣)가 있는 법이니, 기(氣)는 이(理)가 없는 기(氣)가 없다. 그
러므로 일에 불선한 것이 있으면 비록 기(氣)가 한 짓이라고 말하지만,
이 이(理)가 없으면 이 기(氣)도 없는 것이니, 어떻게 기(氣)가 홀로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진흙물이 탁한 것이 물의 본색은 아니지만 물이 아니면 진흙물이
될 수 없고, 좀벌레가 먹는 것이 나무의 본성은 아니지만 나무가 아니
면 좀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나쁜 일이 이(理)의 본연은 아니지만 이
(理)가 없으면 나쁜 일이 말미암아 생겨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理)는 본디 선악을 겸한 것인가? 이(理)의 본연은 본디
순선하여 악이 없지만, 그 기(氣)를 타고 유행(流行)하게 되면 과불급
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기(氣)가 과불급이 없을 수 없는 것은 또한
이(理)의 형세가 그런 것이니, 과불급이 있게 되면 악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인(仁)을 행하되 지나치면 묵적(墨翟)이 되고, 의(義)를 행하되 지
나치면 양주(楊朱)가 되며, 인의(仁義)를 행하되 미치지 못하면 자막
(子莫) 이 된다.
섭공(葉公)이 말한 ‘양을 훔친 아비를 자식이 증언한 것’이 정직할
자막(子莫):노(魯)나라의 대부(大夫)이며, ‘집중(執中)’을 주장하였다. 《맹자
(孟子)》 〈진심 하(盡心上)〉에 “자막은 중간을 잡았으니, 중간을 잡는 것은 도에
가깝다. 그러나 중간을 잡고 저울질함이 없는 것은 한쪽을 잡는 것과 같다. 한쪽을
잡는 것을 싫어하는 까닭은 도를 해치기 때문이니, 하나를 들고 백 가지를 폐하는
것이다.[子莫執中, 執中爲近之, 執中無權, 猶執一也. 所惡執一者, 爲其賊道也, 擧
一而廢百也.]”라고 하였다.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