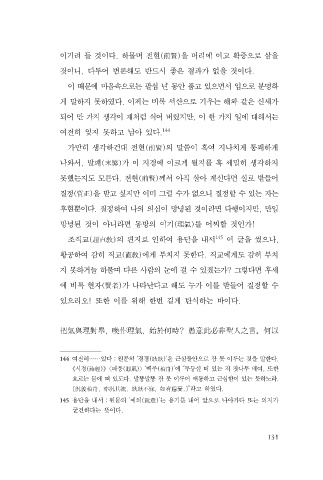Page 131 - 답문류편
P. 131
이기려 들 것이다. 하물며 전현(前賢)을 머리에 이고 확증으로 삼을
것이니, 다투어 변론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팔십 년 동안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 분명하
게 말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비록 서산으로 기우는 해와 같은 신세가
되어 만 가지 생각이 재처럼 식어 버렸지만,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남아 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현(前賢)의 말씀이 혹여 지나치게 통쾌하게
나와서, 말폐(末弊)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될지를 혹 세밀히 생각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전현(前賢)께서 아직 살아 계신다면 실로 받들어
질정(質正)을 받고 싶지만 이미 그럴 수가 없으니 질정할 수 있는 자는
후현뿐이다. 질정하여 나의 의심이 망녕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망녕된 것이 아니라면 동방의 이기(理氣)를 어찌할 것인가!
조직교(趙直敎)의 편지로 인하여 용단을 내서 이 글을 썼으나,
황공하여 감히 직교(直敎)에게 부치지 못한다. 직교에게도 감히 부치
지 못하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의 눈에 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후세
에 비록 현자(賢者)가 나타난다고 해도 누가 이를 받들어 질정할 수
있으리오! 또한 이를 위해 한번 길게 탄식하는 바이다.
把氣與理對擧, 喚作理氣, 始於何時? 愚意此必非聖人之言。 何以
여전히……있다:원문의 ‘경경(耿耿)’은 근심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 〈패풍(邶風)〉 ‘백주(柏舟)’에 “두둥실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여, 또한
흐르는 물에 떠 있도다. 말똥말똥 잠 못 이루어 애통하고 근심함이 있는 듯하노라.
[汎彼柏舟, 亦汎其流. 耿耿不寐, 如有隱憂.]”라고 하였다.
용단을 내서:원문의 ‘예의(銳意)’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다 또는 의지가
굳건하다는 뜻이다.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