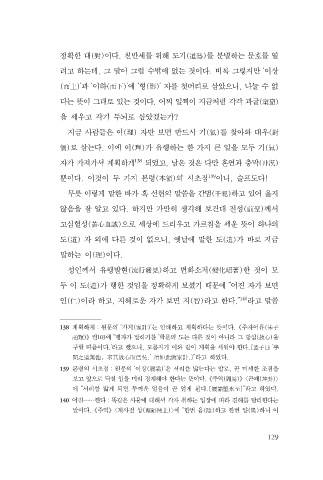Page 129 - 답문류편
P. 129
정확한 대(對)이다. 천만세를 위해 도기(道器)를 분별하는 문호를 열
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이상
(而上)’과 ‘이하(而下)’에 ‘형(形)’ 자를 첫머리로 삼았으니, 나눌 수 없
다는 뜻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어찌 일찍이 지금처럼 각각 과굴(窠窟)
을 세우고 각기 두뇌로 삼았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이(理) 자만 보면 반드시 기(氣)를 찾아와 대우(對
偶)로 삼는다. 이에 이(理)가 유행하는 한 가지 큰 일을 모두 기(氣)
자가 가져가서 계획하게 되었고, 남은 것은 다만 혼연과 충막(冲漠)
뿐이다. 이것이 두 가지 본령(本領)의 시초점 이니, 슬프도다!
무릇 이렇게 말한 바가 혹 선현의 말씀을 간범(干犯)하고 있어 옳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전성(前聖)께서
고심혈성(苦心血誠)으로 세상에 드리우고 가르침을 세운 뜻이 하나의
도(道) 자 외에 다른 것이 없으니, 옛날에 말한 도(道)가 바로 지금
말하는 이(理)이다.
성인께서 유행발현(流行發見)하고 변화소저(變化昭著)한 것이 모
두 이 도(道)가 행한 것임을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어진 자가 보면
인(仁)이라 하고, 지혜로운 자가 보면 지(智)라고 한다.” 라고 말씀
계획하게:원문의 ‘가계(家計)’는 안배하고 계획하다는 뜻이다. 《주자어류(朱子
語類)》 권103에 “맹자가 말하기를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방심(放心)을
구할 따름이다.’라고 했으니, 모름지기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孟子曰 ‘學
問之道無他,求其放心而已矣.’ 須如此做家計.]”라고 하였다.
본령의 시초점:원문의 ‘이상(履霜)’은 서리를 밟는다는 말로, 곧 미세한 조짐을
보고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곤괘(坤卦)〉
에 “서리를 밟게 되면 두꺼운 얼음이 곧 얼게 된다.[履霜堅氷至]”라고 하였다.
어진……한다: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각자 취하는 입장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는
말이다.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한번 음(陰)하고 한번 양(陽)하니 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