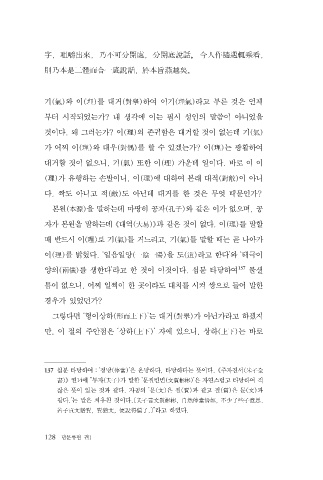Page 128 - 답문류편
P. 128
字, 咀嚼出來, 乃不可分開處, 分開底說話。 今人作隨遇輒乘看,
則乃本是二體而合一底說話, 於本旨燕越矣。
기(氣)와 이(理)를 대거(對擧)하여 이기(理氣)라고 부른 것은 언제
부터 시작되었는가? 내 생각에 이는 필시 성인의 말씀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 그러는가? 이(理)의 존귀함은 대거할 것이 없는데 기(氣)
가 어찌 이(理)와 대우(對偶)를 할 수 있겠는가? 이(理)는 광활하여
대거할 것이 없으니, 기(氣) 또한 이(理) 가운데 일이다. 바로 이 이
(理)가 유행하는 손발이니, 이(理)에 대하여 본래 대적(對敵)이 아니
다. 짝도 아니고 적(敵)도 아닌데 대거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본원(本源)을 말하는데 마땅히 공자(孔子)와 같은 이가 없으며, 공
자가 본원을 말하는데 《대역(大易)》과 같은 것이 없다. 이(理)를 말할
때 반드시 이(理)로 기(氣)를 거느리고, 기(氣)를 말할 때는 곧 나아가
이(理)를 밝혔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道)라고 한다’와 ‘태극이
양의(兩儀)를 생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십분 타당하여 물샐
틈이 없으니, 어찌 일찍이 한 곳이라도 대치를 시켜 쌍으로 들어 말한
경우가 있었던가?
그렇다면 ‘형이상하(形而上下)’는 대거(對擧)가 아닌가라고 하겠지
만, 이 절의 주안점은 ‘상하(上下)’ 자에 있으니, 상하(上下)는 바로
십분 타당하여:‘정당(停當)’은 온당하다, 타당하다는 뜻이다. 《주자전서(朱子全
書)》 권14에 “부자(夫子)가 말한 ‘문질빈빈(文質彬彬)’은 자연스럽고 타당하여 적
잖은 뜻이 있는 것과 같다. 자공의 ‘문(文)은 질(質)과 같고 질(質)은 문(文)과
같다.’는 말은 치우친 것이다.[夫子言文質彬彬, 自然停當恰如, 不少了些子意思.
若子貢文猶質, 質猶文, 便說得偏了.]”라고 하였다.
128 답문류편 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