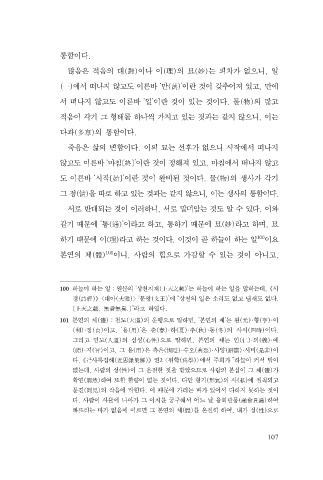Page 107 - 답문류편
P. 107
통함이다.
많음은 적음의 대(對)이나 이(理)의 묘(妙)는 피차가 없으니, 일
(一)에서 떠나지 않고도 이른바 ‘만(萬)’이란 것이 갖추어져 있고, 만에
서 떠나지 않고도 이른바 ‘일’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물(物)의 많고
적음이 각기 그 형태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이는
다과(多寡)의 통함이다.
죽음은 삶의 변함이다. 이의 묘는 선후가 없으니 시작에서 떠나지
않고도 이른바 ‘마침[終]’이란 것이 정해져 있고, 마침에서 떠나지 않고
도 이른바 ‘시작[始]’이란 것이 완비된 것이다. 물(物)의 생사가 각기
그 정(情)을 따로 하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이는 생사의 통함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이러하니, 서로 말미암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와
같기 때문에 ‘통(通)’이라고 하고, 통하기 때문에 묘(妙)라고 하며, 묘
하기 때문에 이(理)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이 하는 일 이요
본연의 체(體) 이니, 사람의 힘으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하는 일:원문의 ‘상천지재(上天之載)’는 하늘이 하는 일을 말하는데, 《시
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上天之載, 無聲無臭.]”라고 하였다.
본연의 체(體):천도(天道)의 운행으로 말하면, ‘본연의 체’는 원(元)·형(亨)·이
(利)·정(貞)이고, ‘용(用)’은 춘(春)·하(夏)·추(秋)·동(冬)의 사시(四時)이다.
그리고 인도(人道)의 심성(心性)으로 말하면, 본연의 체는 인(仁)·의(義)·예
(禮)·지(智)이고, 그 용(用)은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이
다.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2 〈위학(爲學)〉에서 주희가 “하늘이 커서 밖이
없는데, 사람의 성(性)이 그 온전한 것을 받았으므로 사람의 본심이 그 체(體)가
확연(廓然)하여 또한 한량이 없는 것이다. 다만 형기(形氣)의 사(私)에 질곡되고
문견(聞見)의 작음에 막힌다. 이 때문에 가리는 바가 있어서 다하지 못하는 것이
다. 사람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서 어느 날 융회관통(融會貫通)하여
빠뜨리는 바가 없음에 이르면 그 본연의 체(體)를 온전히 하여, 내가 성(性)으로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