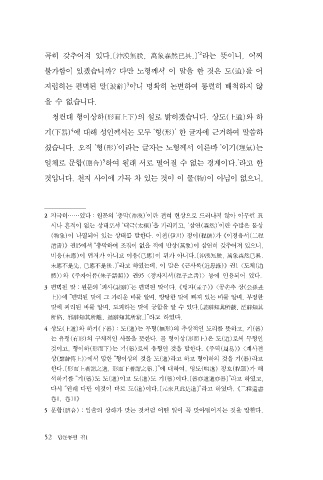Page 52 - 답문류편
P. 52
곡히 갖추어져 있다.[沖漠無朕, 萬象森然已具.]’ 라는 뜻이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노형께서 이 말을 한 것은 도(道)를 어
지럽히는 편벽된 말[詖辭] 이니 명확히 논변하여 통렬히 배척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이상하(形而上下)의 설로 밝히겠습니다. 상도(上道)와 하
기(下器) 에 대해 성인께서는 모두 ‘형(形)’ 한 글자에 근거하여 말씀하
셨습니다. 오직 ‘형(形)’이라는 글자는 노형께서 이른바 ‘이기(理氣)는
일체로 문합(脗合) 하여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경계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천지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물(物)이 아님이 없으니,
지극히……있다:원문의 ‘충막(冲漠)’이란 전혀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무런 표
시나 흔적이 없는 상태로서 ‘태극(太極)’을 가리키고, ‘삼연(森然)’이란 수많은 물상
(物象)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이정유서(二程
遺書)》 권15에서 “충막하여 조짐이 없을 적에 만상(萬象)이 삼연히 갖추어져 있으니,
미응(未應)이 먼저가 아니고 이응(已應)이 뒤가 아니다.[沖漠無朕, 萬象森然已具.
未應不是先, 已應不是後.]”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
體)〉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5 〈정자지서(程子之書)〉 등에 인용되어 있다.
편벽된 말:원문의 ‘피사(詖辭)’는 편벽된 말이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
上)〉에 “편벽된 말에 그 가리운 바를 알며, 방탕한 말에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 괴리된 바를 알며, 도피하는 말에 궁함을 알 수 있다.[詖辭知其所蔽, 淫辭知其
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라고 하였다.
상도(上道)와 하기(下器):도(道)는 무형(無形)의 추상적인 도리를 뜻하고, 기(器)
는 유형(有形)의 구체적인 사물을 뜻한다. 곧 형이상(形而上)은 도(道)로써 무형인
것이고, 형이하(形而下)는 기(器)로써 유형인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 〈계사전
상(繫辭傳上)〉에서 말한 “형이상의 것을 도(道)라고 하고 형이하의 것을 기(器)라고
한다.[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에 대하여,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해
석하기를 “기(器)도 도(道)이고 도(道)도 기(器)이다.[器亦道道亦器]”라고 하였고,
다시 “원래 다만 이것이 바로 도(道)이다.[元來只此是道]”라고 하였다. 《二程遺書
卷1, 卷11》
문합(脗合):입술의 상하가 맞는 것처럼 어떤 일이 꼭 맞아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52 답문류편 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