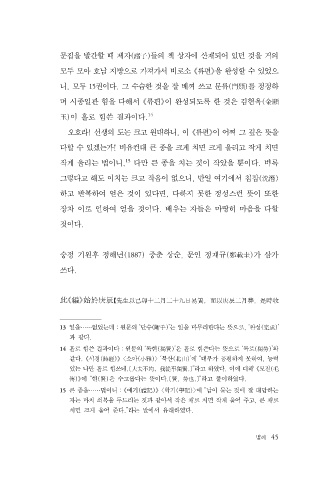Page 45 - 답문류편
P. 45
문집을 발간할 때 제자(諸子)들의 책 상자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거의
모두 모아 호남 지방으로 가져가서 비로소 《류편》을 완성할 수 있었으
니, 모두 15권이다. 그 수습한 것을 잘 베껴 쓰고 문류(門類)를 정정하
며 시종일관 힘을 다해서 《류편》이 완성되도록 한 것은 김현옥(金顯
玉)이 홀로 힘쓴 결과이다.
오호라! 선생의 도는 크고 원대하니, 이 《류편》이 어찌 그 깊은 뜻을
다할 수 있겠는가! 비유컨대 큰 종을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는 법이니, 다만 큰 종을 치는 것이 작았을 뿐이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이치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 만일 여기에서 침잠(沈潛)
하고 반복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다하지 못한 정성스런 뜻이 또한
장차 이로 인하여 얻을 것이다.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다.
숭정 기원후 정해년(1887) 중춘 상순, 문인 정재규(鄭載圭)가 삼가
쓰다.
此《編》始於庚辰【先生以己卯十二月二十九日易簀, 而以庚辰二月葬, 是時收
일을……없었는데:원문의 ‘단수(斷手)’는 일을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완성(完成)’
과 같다.
홀로 힘쓴 결과이다:원문의 ‘독현(獨賢)’은 홀로 힘쓴다는 뜻으로 ‘독로(獨勞)’와
같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북산(北山)’에 “대부가 공평하지 못하여, 능력
있는 나만 홀로 힘쓰네.[大夫不均,我從事獨賢.]”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모전(毛
傳)》에 “현(賢)은 수고롭다는 뜻이다.[賢, 勞也.]”라고 풀이하였다.
큰 종을……법이니:《예기(禮記)》 〈학기(學記)〉에 “남이 묻는 것에 잘 대답하는
자는 마치 쇠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서 작은 채로 치면 작게 울어 주고, 큰 채로
치면 크게 울어 준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범례 45